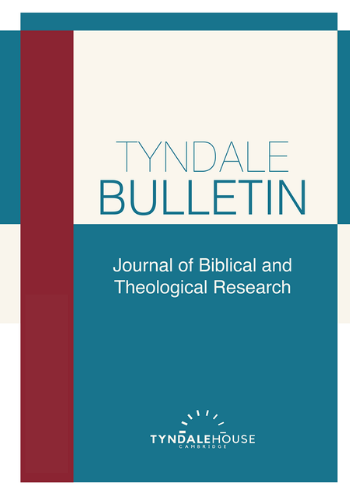예수께서 왕국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은 그의 청중이 그 개념에 익숙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곳은 구약 성경이다. 비록 그 용어 자체는 구약에서 드물게 발견되지만, 몇몇 곳에서 나타나기는 한다. 왕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단연 가장 풍부한 구약의 자료는 시편인데, 이는 시편이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티프는 (시편) 4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책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양식 비평 모델의 우세로 인해 이곳의 언어를 왕국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더 새로운 정경적 접근법은 하나님의 통치 언어가 어떻게 이 책이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의 특정한 필요에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이는 야훼(YHWH)의 통치를 말하는 시편 93편, 97편, 99편에서 특히 중요하다. 비록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들은 요한계시록의 왕국 묘사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는데, 요한계시록 역시 고난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왕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선포에 나타난 왕국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추상적인 진술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들었던 공동체의 필요를 다루는 메시지였다.
Jesus’s use of the language of the kingdom assumes that his audience was familiar with the concept. The most obvious place to seek a background for it is therefore in the Old Testament. Although the term itself is found only infrequently there, it does occur at a few points. By far the richest Old Testament source for understanding the kingdom is the book of Psalms because of its consistent emphasis on the theme of God as king. This motif comes to particular prominence in Book 4. Previous studies of this book have struggled to connect the language here to the kingdom because of the dominance of form critical models, but newer canonical approaches allow us to understand more clearly how the language of God’s reign is here applied to the particular needs of the community addressed by that book.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Psalms 93, 97, and 99, which speak of YHWH’s reign. Although not explicitly cited in the New Testament, these psalms provide important background to the presentation of the kingdom in the book of Revelation, which likewise uses the language of the kingdom to provide hope for those who struggle.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in Jesus’s proclamation is therefore not an abstract statement about God’s reign but a message that addressed the needs of the community who heard 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