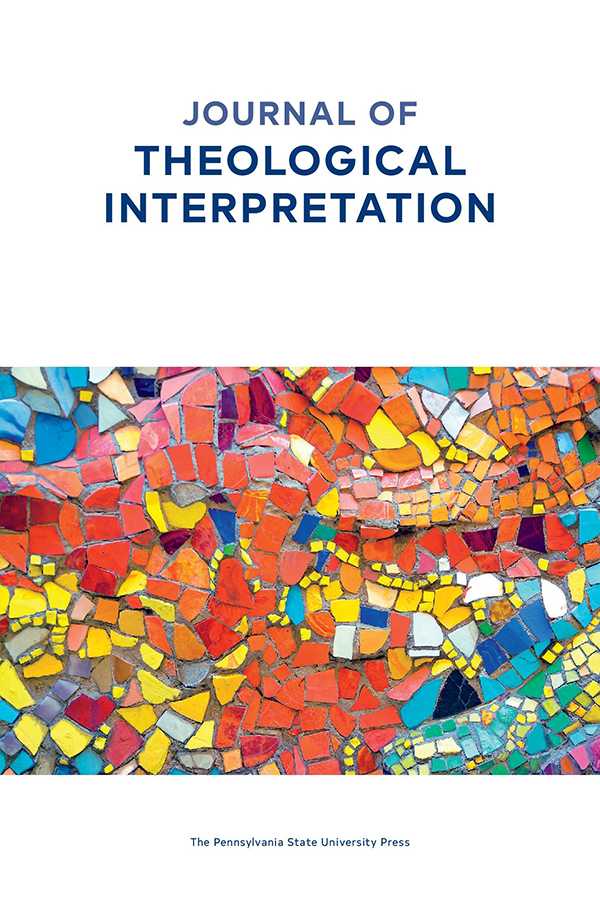https://doi.org/10.2307/26421340
신명기 7장은 성경을 읽는 기독교 독자에게 어려운 텍스트다. 한편으로는, 신명기 7장이 야훼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우상 숭배와 그로 이어지는 충성심의 거부에 대한, '쉐마'(신 6:4-9)에 대한 충실한 반응에 내용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명기 7장은 아마도 구약에서 חרם(헤렘, 완전한 파괴)의 주요한 표현일 것이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주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므로 매우 문제가 많은 텍스트다. 이 에세이는 여러 단계에 걸쳐 텍스트의 기독교적 의미를 다룰 것이다. 첫째, 신구조주의 분석과 더불어 신명기 내에서의 문맥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텍스트가 담론으로서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하고, 텍스트의 후기 의미를 고려하기 위한 참조 틀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후기 의미는 구약과 신약의 맥락에서 연구된다. 둘째, 텍스트에 대한 기독교 수용 및 사용의 역사를 살펴본 후, 셋째, 우상 숭배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반응의 본질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7장의 현대 기독교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이 구약에 대한 기독교적 읽기에 제기하는 해석학적 문제들을 탐구할 것이다.
Deuteronomy 7 is a challenging text for the Christian reader of Scripture. On the one hand, it appears to give content to faithful responsiveness to the Shema' (Deut 6:4–9) in the context of Yhwh's love and election of Israel relating to the rejection of idolatry and allegiances that lead to idolatry. On the other hand, it is perhaps the primary expression of חרם in the OT, commanding the utter annihilation of the local inhabitants of the promised land as Israel enters the land, and is thus a deeply problematic text. This essay will address the Christian significance of the text in several stages. First, the use of neostructuralist analysis coupled with careful analysis of the text in its context in Deuteronomy will clarify the function of the text as discourse as well as provide a frame of reference for considering its later significance, which is studied in the context of the OT and the NT. Second,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reception and use of the text is considered before, third, considering the nature of faithful responsiveness to God in regard to the problem of idolatry and how the perception of idolatry has developed theologically. Finally, the question of the contemporary Christian significance of Deut 7 is considered, with some exploration of the hermeneutical issues that this raises for Christian reading of the 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