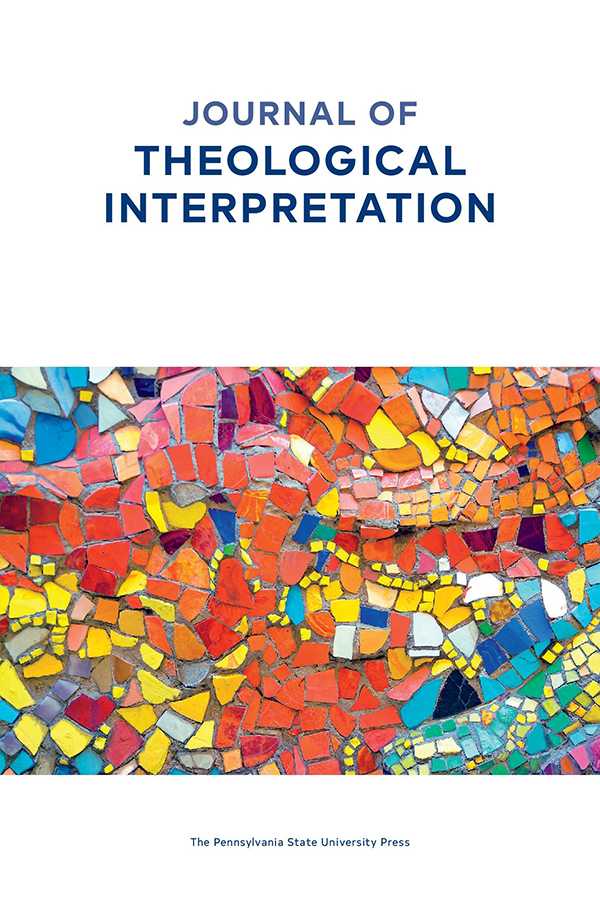https://doi.org/10.2307/26421327
존 레벤슨의 저서, 『시나이와 시온: 유대 성경 입문』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신현적(神顯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특히 동방 정교회의 성경 입문을 이끌어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시나이 신현과 타볼 산의 변모를 연결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구약"으로 채택하는 기반이 되었고, 이원론과 군주신론에 대한 논쟁적 사용에 적합했으며, 결국 비잔틴 축제 찬송가에 흡수되어 전례에서 수행되고 경험되는 주류 신학으로 자리 잡았다.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신현을 다루는 초기 기독교 작품과 후기 비잔틴 축제 찬송가 및 성화에서도 유사한 해석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 시나이, 시온, 타볼을 다루는 찬송가와 성화를 논의한 후, 본 논문은 이러한 유형의 주석이 교부 주석을 설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주 내에서 구성하기 어렵고, 구약 위경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재기록된 성경"이라는 범주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논문은 논의 중인 찬송가에서 나타나는 기독론과 규범적인 공의회 기독론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오늘날의 독자들이 비잔틴 찬송가 및 성화 주석으로부터 주석적 및 신학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Building on the insights of Jon Levenson's work, Sinai and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this article endeavors to show that a similar approach, which could be labeled "theophanic," has traditionally guided the Christian—perhaps especially the Eastern Orthodox—entry into the Bible. Relating the Sinai theophany and the transfiguration on Tabor was crucially important for early Christian theology. It underlay their appropriation of the Scriptures of Israel as "OT," it lent itself to polemical use against dualism and monarchianism, and it was eventually absorbed into Byzantine festal hymnography and thereby into the mainstream of theology as performed and experienced in liturgy. Similar interpretive strategies are at work in early Christian works and later Byzantine festal hymns and icons that take up theophanies centering on God's throne in Zion. After discussing hymns and icons dealing with Sinai, Zion, and Tabor, I argue that this type of exegesis is difficult to frame within the categories commonly used to describe patristic exegesis and that a more suitable category would be that of "rewritten Bible," current among scholars of the OT pseudepigrapha. I then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ology emerging from the hymns under discussion and the normative conciliar Christology. Finally, I sketch a few ways in which today's readers can benefit, both exegetically and theologically, from Byzantine hymnographic and iconographic exeg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