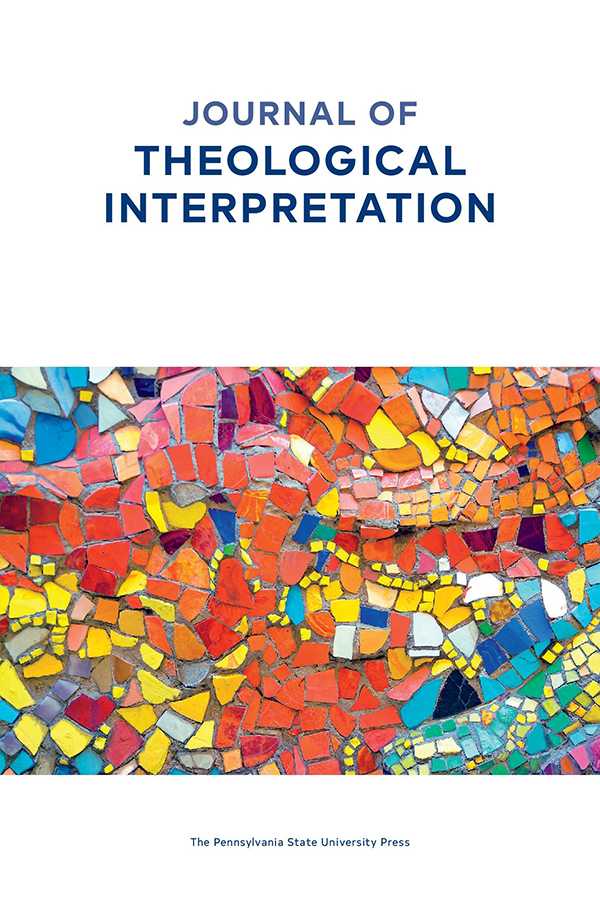https://doi.org/10.2307/26421289
욥기는 주인공이 부당한 고통의 전형적인 인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관련 담론에서 자주 인용된다. 이 글에서는 욥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즉 부당한 고통에 대한 최종적인 신학적 개념화를 와해시키는 다성적인 텍스트로서 홀로코스트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신정론에 저항하려는 이러한 충동은 홀로코스트가 더 넓은 종교적 서사로 흡수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 의해 자주 표명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시도에 반하여 신학적 해결을 향한 강력한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이른바 "반신정론"과 단편화에 대한 호소를 단순한 수사로 전락시킨다. 이러한 역학을 고려하기 위해, 홀로코스트 이후 욥기에 대한 두 가지 수용, 즉 데이비드 블루멘탈과 어빙 그린버그의 해석을 살펴볼 것이다. 욥기는 신학자들에 의한 자신의 활용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는 내적으로 불협화음적인 텍스트로 이해될 때, 홀로코스트 기억 속에서 최종화, 망각, 그리고 이 현대 역사의 근본적으로 어두운 요소에 대한 종교적 "수용"에 저항하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The book of Job is cited with frequency within discourse on the Holocaust because of its protagonist's status as an archetypal figure of undeserved suffering.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may be further viewed as a resource in this context in a differing way: as a polyphonic text that acts as a disruptive force against finalized theological conceptualizations of unwarranted suffering. This urge to resist theodicy is one that has been often articulated by respondents to the Holocaust wishing to avoid the event's absorption into broader religious narratives. Yet, in certain instances, this is counter-voiced by a powerful drift toward theological resolution that renders appeals of this sort to "antitheodicy" and fragmentation little more than rhetoric. To consider these dynamics, two post-Holocaust receptions of the book of Job will be examined—those of David Blumenthal and Irving Greenberg. Job, it will be proposed, when understood as an internally dissonant text that queries its own utilization by theologians, can as act as a subversive force within Holocaust memory that pushes against finalization, forgetfulness, and religious "acceptance" of this radically dark element of modern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