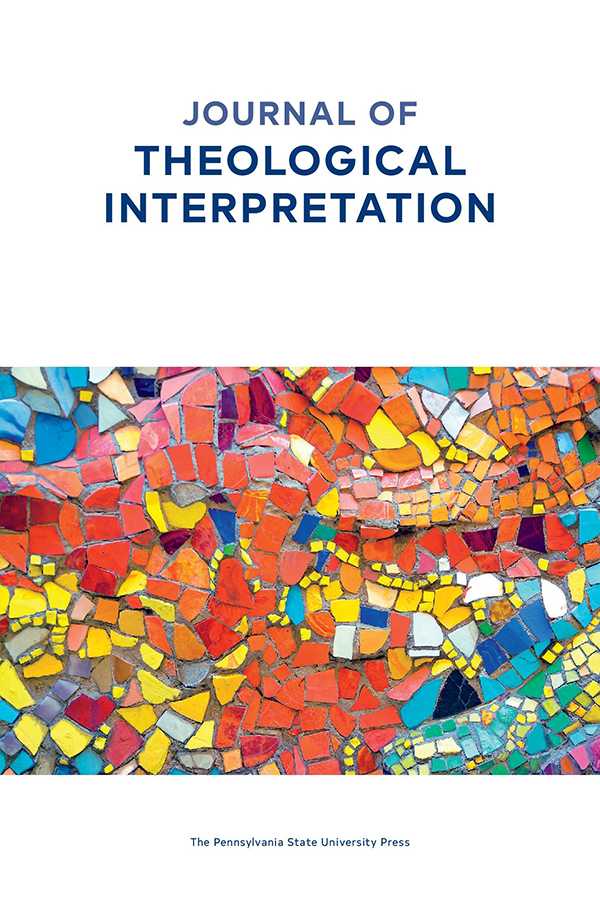https://doi.org/10.2307/26421368
이 에세이는 요한 칼빈의 적응 교리(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인간의 능력에 맞춰 자신을 적응시키거나 조절한다는 교리)와 출애굽기 19-34장의 신현(神顯) 이야기를 결합하려는 시도다. 먼저, 이 에세이는 적응 교리가 신현 본문의 오랜 난제들, 특히 출애굽기 19-20장의 일반적인 모호성과 출애굽기 24:10에서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수수께끼 같은 주장에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 에세이는 해당 본문들이 적응 교리를 미묘하게 조정하여, 그 교리에 대한 비판자들의 일부, 특히 하나님 자체(in se)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quoad nos)을 구별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응 교리는 일부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성경 해석에서 신학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출애굽기 19-34장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본문에 적용되는 도구이며, 그 적절성은 해석적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 이 에세이는 칼빈의 적응 교리와 시내산 이야기 간의 대화가 양쪽 모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유익할 것이며, 칼빈의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해 잘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하지만, 결코 오류가 없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This essay attempts to bring together John Calvin's doctrine of accomodation (i.e., that God accommodates, or adjusts, himself to human capacity in order to reveal himself to us) and the theophany narratives of Exod 19-34. First, it argues that the doctrine of accommodation may shed light on some of the perennial difficulties of the theophany texts, specifically the general ambiguity of Exod 19-20 and the mysterious claim that the elders "saw the God of Israel" in Exod 24:10. Second, it argues that those texts may nuance the doctrine of accommodation so as to enable a response to some of its critics, particularly regarding the question of differentiating between God in se and God quoad nos. The doctrine of accommodation is not derived from Exod 19–34 in the way that some envision the movement from exegesis to theology. It is rather a tool brought to the text, albeit one whose appropriateness is demonstrated by its exegetical results. This essay contends that a dialogue between Calvin's doctrine of accommodation and the Sinai narratives will be profitable for our understanding of both, and that Calvin's doctrine is a valuable, though not infallible, tool for those wishing to speak well of God on the basis of Scrip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