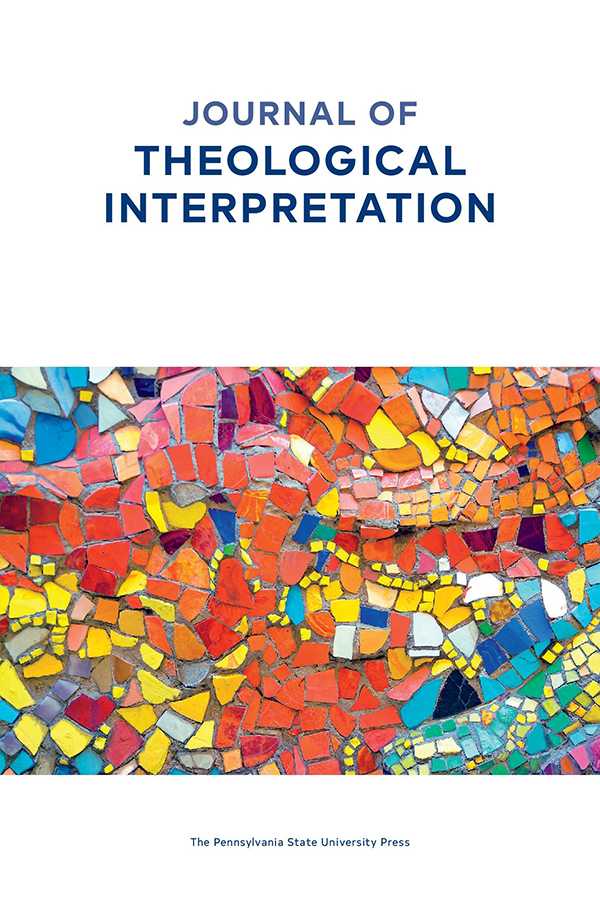https://doi.org/10.5325/jtheointe.12.2.0287
신명기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백성은 아직 "요단 강 건너편"에 있으므로(신 1:1),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백성은 이미 사십 년을 방랑했으며,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다. 데이비드 M. 앨런은 이를 희망찬 기대의 "신명기적 자세"라고 묘사한다. 나는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어떻게 포착하고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미래 세대의 신실한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살펴본다. 신명기에 대한 공시적 독해에 그 작품의 후대 타르굼 해석을 보완한 후, 나는 1 마카비서, 사해문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를 포함한 후기 제2성전기 문헌에서 동일한 역동성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신명기적 자세"를 취하는 다양한 본문들을 고려하여, 나는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논의에서 "신명기적 자세"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The book of Deuteronomy addresses Israel in the wilderness, pois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The people have not yet arrived in the promised land, since they are still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Deut 1:1). But they have already wandered for forty years, and they now stand ready to enter the land, in what David M. Allen has described as a “Deuteronomic posture” of hopeful expectation. I examine how Deuteronomy itself captures and communicates something essential about the experience of the people of God, something that it makes available to future generations of faithful readers. After supplementing a synchronic reading of Deuteronomy with later targumic interpretations of the work, I look at instances of the same dynamic in late Second Temple literature, including 1 Maccabees, the Dead Sea Scrolls, 1 Corinthians, and Hebrews. Given the wide range of texts that adopt a Deuteronomic posture, I close with a treatment of the role a “Deuteronomic posture” might play in twenty-first-century conversations about Christian life in a post-Christendom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