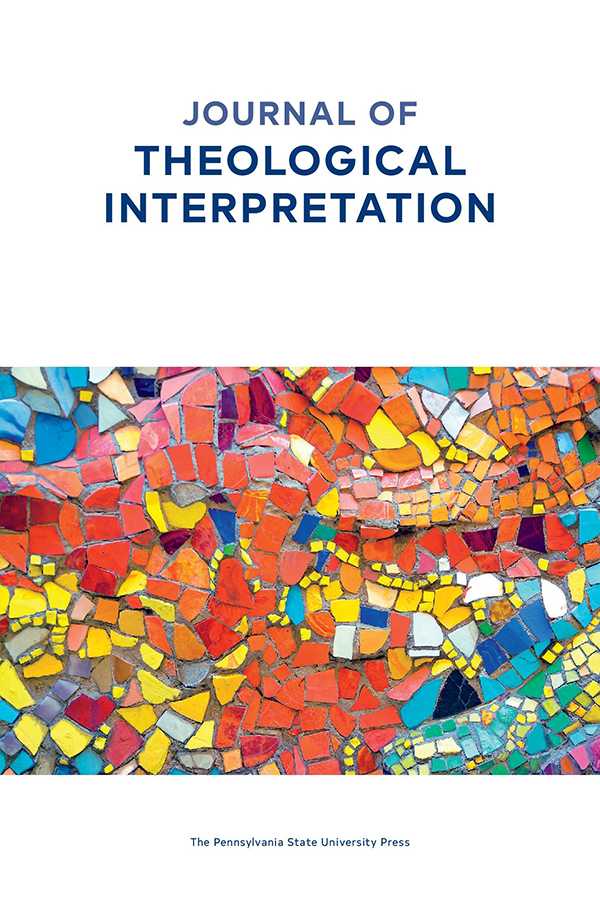https://doi.org/10.2307/26421569
룻기 4장에 나오는 보아스와 이름 없는 기업무를자의 논의는 오랫동안 레위기 25장(기업 무를 자)과 신명기 25장(계대 결혼)의 사회적 관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거의 독점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 글은 학계가 이러한 논의에 담긴 중요한 신학적 층위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신학적 요소는 룻기 4:4-5에서 "무르다"와 "사다"라는 두 용어의 결합을 통해 표현된다. 이 글은 이 두 용어의 결합에 대한 선례가 레위기 25장의 기업 무를 자라는 사회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신학적 반영을 채택한 결과이며, 시편 74편, 신명기 32편,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다른 출애굽 사건에 대한 신학적 반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신학적 요소는 룻기 4장에서 "무르다"와 "사다"가 특이하게 결합된 이유를 설명하며, 룻기 이야기가 편집 배경과 더 넓은 성경 정경, 심지어 신약성경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식을 제시한다.
The deliberations between Boaz and the unnamed redeemer in Ruth 4 have long been interpreted almost exclusively through the lens of social customs from Lev 25 (kinsman redeemer) and Deut 25 (levirate marriage). This article suggests that scholarship has missed an important theological layer to these deliberations. This theological element is expressed through the coordination of two terms, redeem and acquire, in Ruth 4:4–5. This article suggests that precedent for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terms is not established by the social custom of the kinsman redeemer in Lev 25 but rather by the adoption of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exodus account from Exod 15, and should be set alongside other theological reflections of the exodus account found in Ps 74, Deut 32, and Isa 11. This theological element explains the curious combination of redeem and acquire in Ruth 4 and provides a new way of reading the role that the story of Ruth might play in its compositional setting and in the broader biblical canon, including the 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