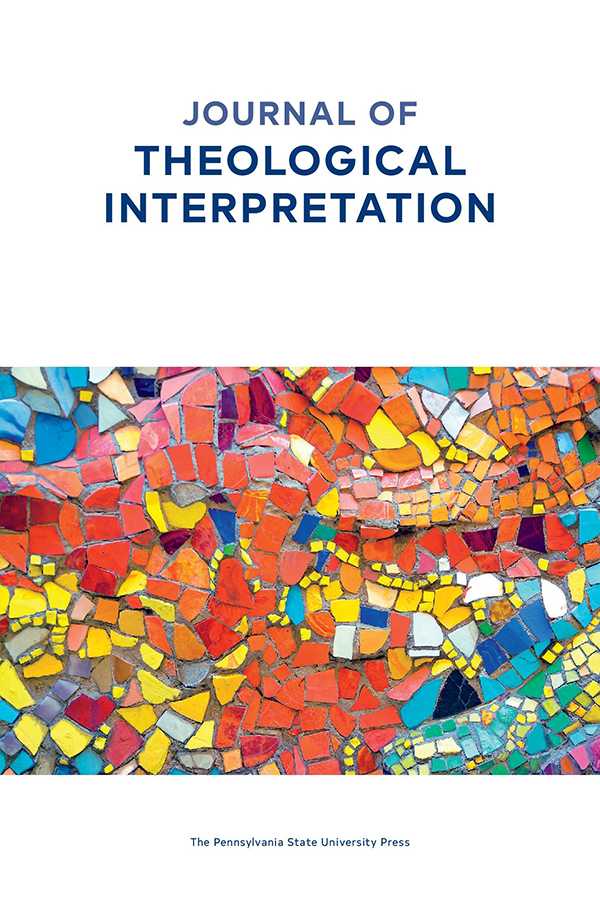https://doi.org/10.5325/jtheointe.16.2.0234
4세기 이래로 마가복음 13장 32절과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예수의 무지에 대한 증거로 삼아 종속주의, 케노시스, 에비온주의적 기독론적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상용하였다. 한편,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한 교부 주석을, 고전 기독교 전통이 비역사적 가현설적 자의적 해석을 전개하였다는 증거로 상용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러한 비판들이 부당함을 보이고자 이 본문에 대한 교부 주석을 고찰한다. 교부들은 예수의 인성을 추상적, 철학적 난제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유신론적 형이상학적 틀 안에서 상호텍스트적 관심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들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 사이의 경쟁을 그의 신성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의 인성을 훼손하거나 포기하려 위협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맞서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자 온전히 인간이라는 고백을 견지하였다. 필자는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사상의 특정 철학적 발전이 교부들의 해석 전통을 옹호하는 동시에 해당 구절에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확장하는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안한다.
Since the fourth century, Mark 13:32/Matt 24:36 have regularly been taken in hand as evidence of Jesus’s ignorance and used to advance subordinationist, kenotic, or Ebionite christological agendas. Meanwhile, modern biblical scholars regularly use patristic commentary on this passage as evidence that the classical Christian tradition advanced ahistorical, docetic eisegesis. In this essay, I consider patristic commentary on this pericope to show that these criticisms are unwarranted. The church fathers did not consider Jesus’s humanity to be an abstract, philosophical conundrum. Rather, their approach was driven by intertextual concerns set within a theistic metaphysical framework. They did not resolve a competition between Jesus’s humanity and divinity in favor of his divinity but upheld the confession that he was fully God and fully man in the face of a variety of approaches that threatened to corrupt or relinquish his humanity. I suggest that certain philosophical developments in the thought of Thomas Aquinas (1225–1274) allow us to make distinctions that both uphold the patristic exegetical tradition and extend it in ways that do greater justice to the pas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