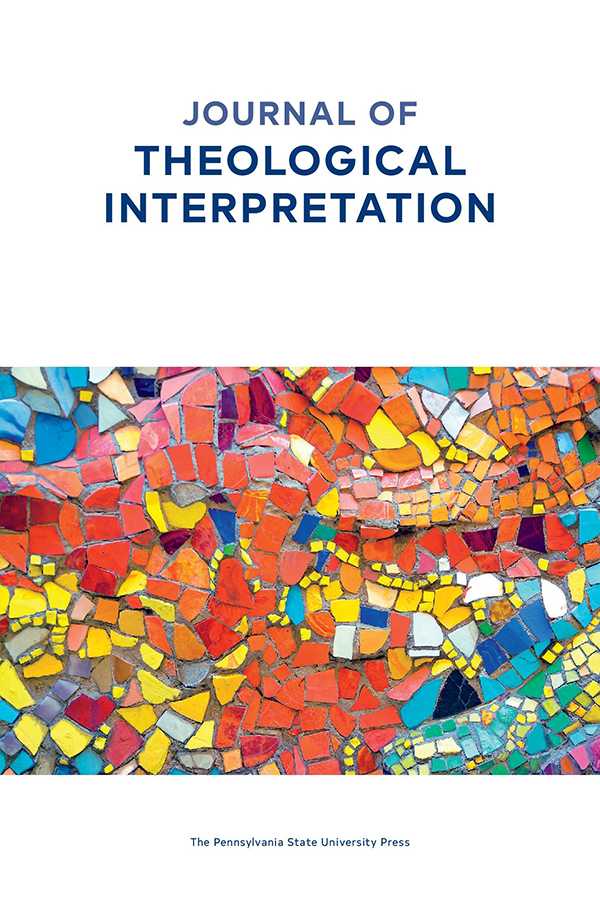https://doi.org/10.2307/26373992
최근 15년간 제출된 정경 해석 제안들을 살펴보면, 신학자들이 제출하는 제안들과 성서학자들이 제출하는 제안들 사이에 점진적인 균열이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오래되었지만 크게 인식되지 않은 과물질적 정경 읽기와 비물질적 정경 읽기 형태 간의 구분을 확인할 것이다. 과물질적 읽기는—종종 성서학자들이 채택하는 방식인데—정경의 기능 방식과 정경의 형성 방식을 융합한다. 두 번째 유형인 비물질적 읽기는 정경의 통일성에 초점을 맞추며, 신학자들이 주로 취하는 입장이다. 이 지지자들은 정경의 물리적 특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지만, 정경의 통일성이 외부로부터—신학적 (그리고 신 중심적) 결속력이라는 렌즈를 통해—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3의 선택지 또는 그 간극을 좁히는 다리가 필요하다.
By surveying proposals on canonical interpretation submitted in the last 15 years, we can trace a gradual rift between the proposals that theologians submit and the proposals that biblical scholars submit. In particular, we will identify an old but largely unrecognized distinction between hypermaterial and nonmaterial forms of canonical reading. The hypermaterial reading—often adopted by biblical scholars—fuses how the canon functions with how the canon was formed. The second type of reading, a nonmaterial reading, focuses on canonical unity and tends to be a position held by theologians. These proponents do not completely abandon the physical features of canon but claim that the unity of the canon comes from the outside—through the lens of theological (and a theocentric) cohesion. Given these two extremes, either a third option or a bridge that closes the gap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