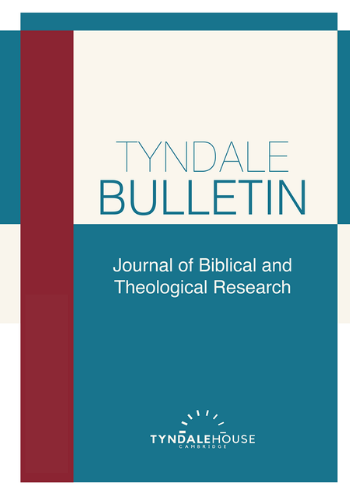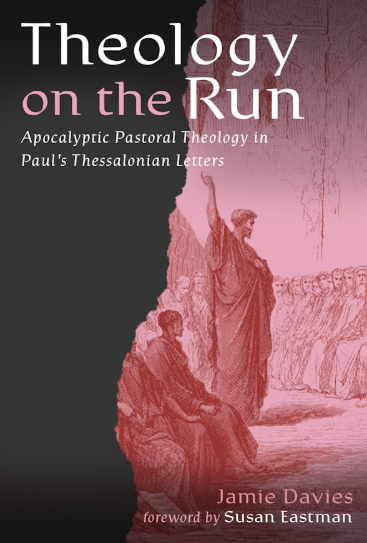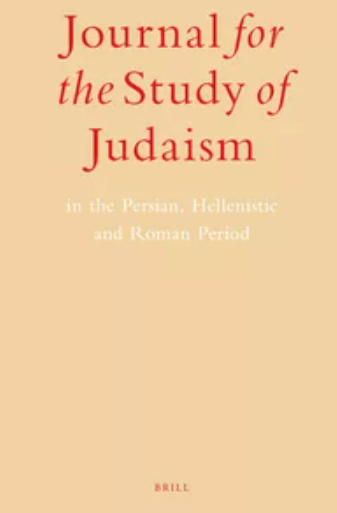하늘 성전 사상은 신약성경을 포함한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신약학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주제인데, 특히 이와 관련되면서도 덜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로서의 성전'이나 '공동체로서의 성전'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본 논문은 먼저 신약성경에 나타난 이 주제의 범위를 개괄한다. 그다음 이러한 간과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그중 하나인 고대의 우주 개념과 현대 과학적 우주론 사이의 불일치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이 간극을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를 탐구하고 비판하는데, 이 논쟁은 계속해서 불트만의 '비신화화' 범주에 영향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약 저자들의 우주론을 '신화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성전과 하늘의 연결은 하나님 거처의 본질에 대해 설득력 있게 말해준다고 주장한다.
The idea of a heavenly temple is widespread in the ancient world, including in the New Testament. Yet it has been a neglected theme in New Testament scholarship, certainly by comparison with the related yet less prominent themes of Christ as temple and community as temple. This article first outlines the extent of the theme in the New Testament. It then outlines reasons for this neglect before focusing on one: the mismatch between ancient conceptualisations of the universe and modern scientific cosmology. It explores and critiques a number of attempts to account for this gulf, a debate which continues to be influenced by Bultmann’s category of demythologisation. It finally argues that, even on a ‘mythological’ construal of the New Testament writers’ cosmology, the connection of temple with heaven speaks eloquently of the nature of God’s ab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