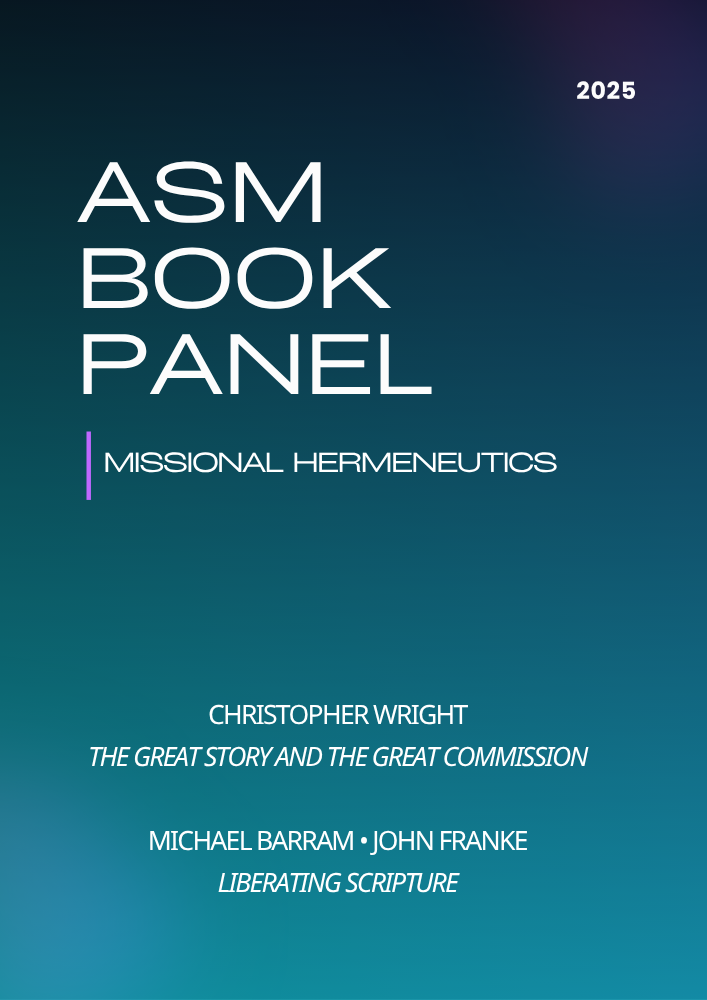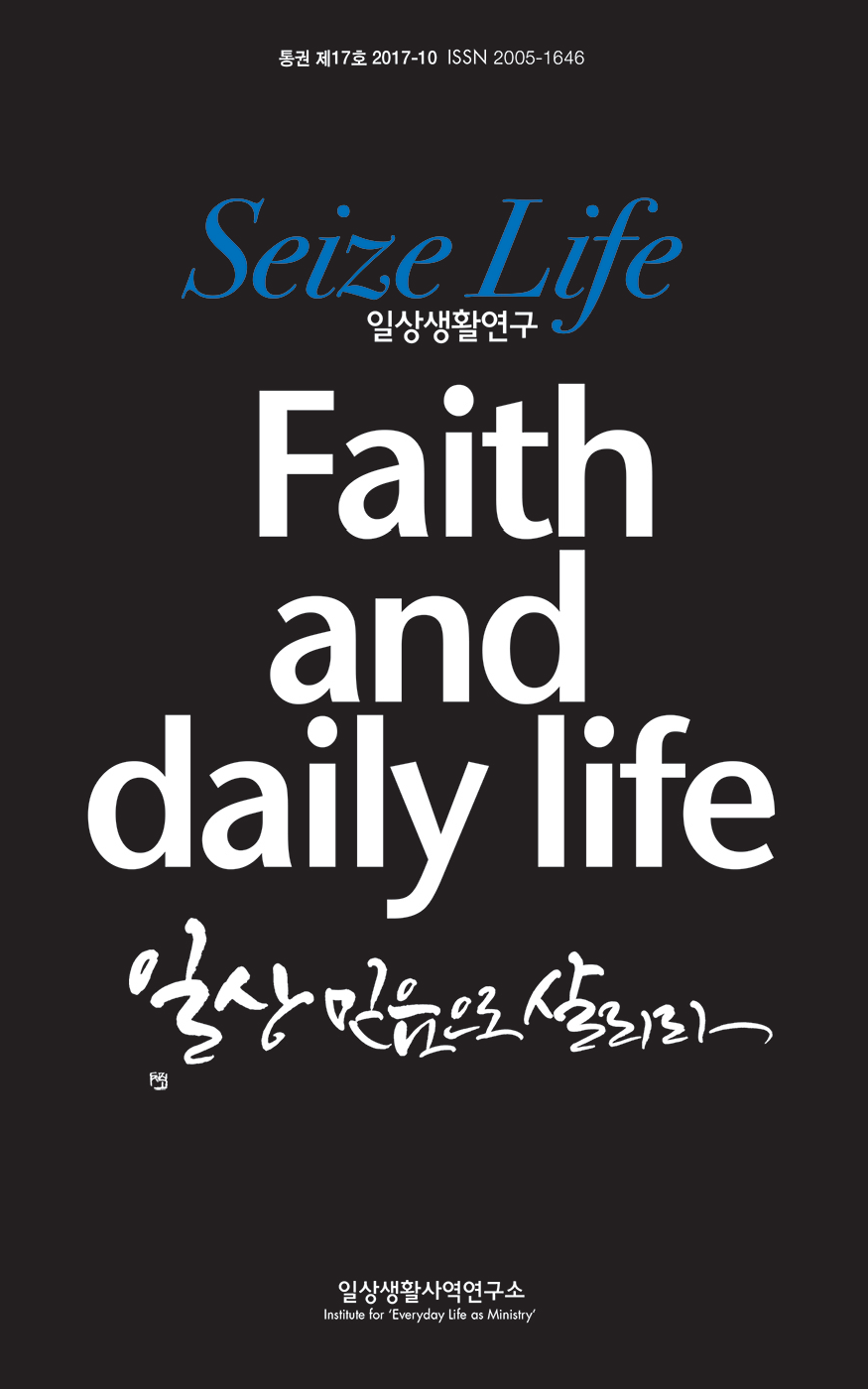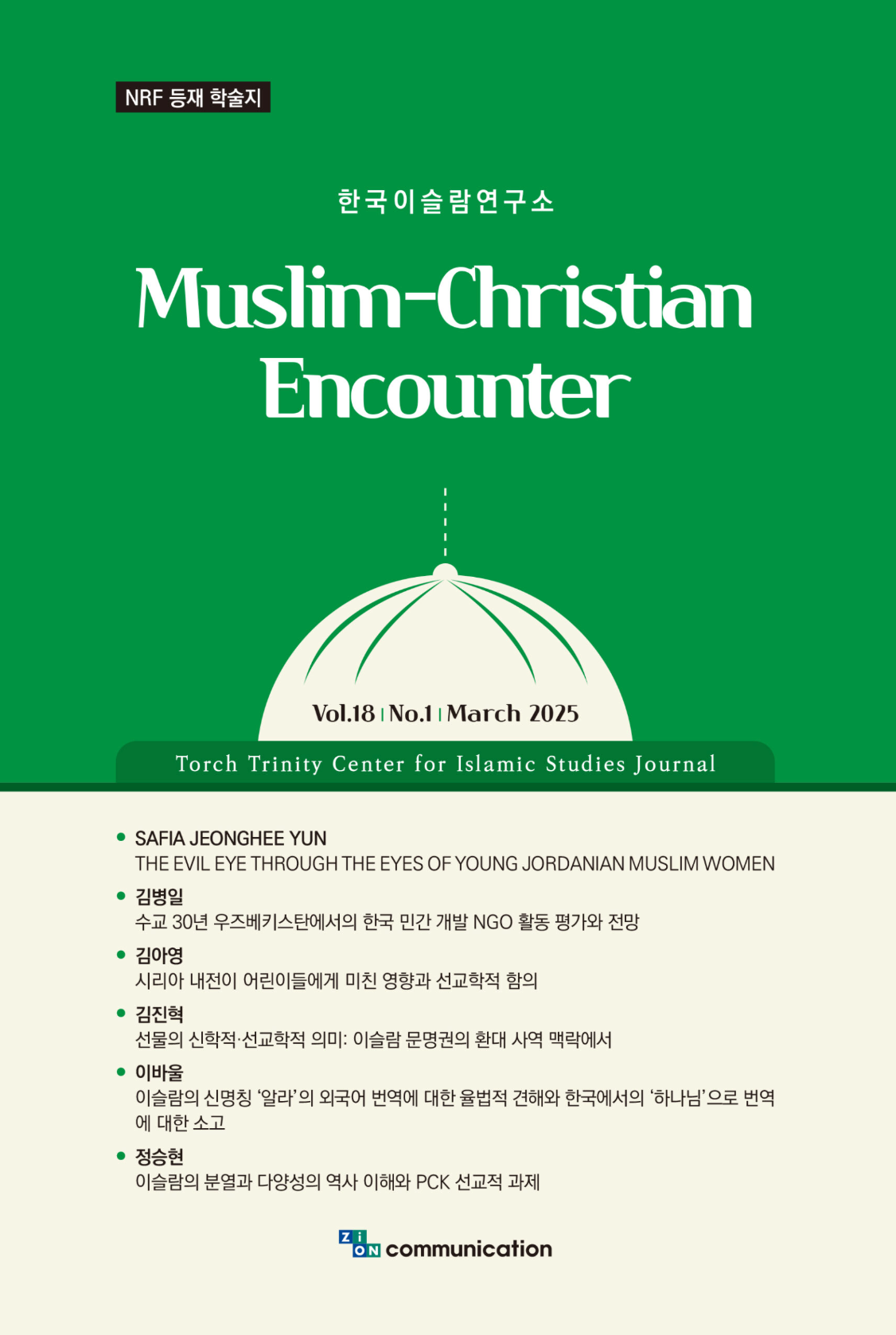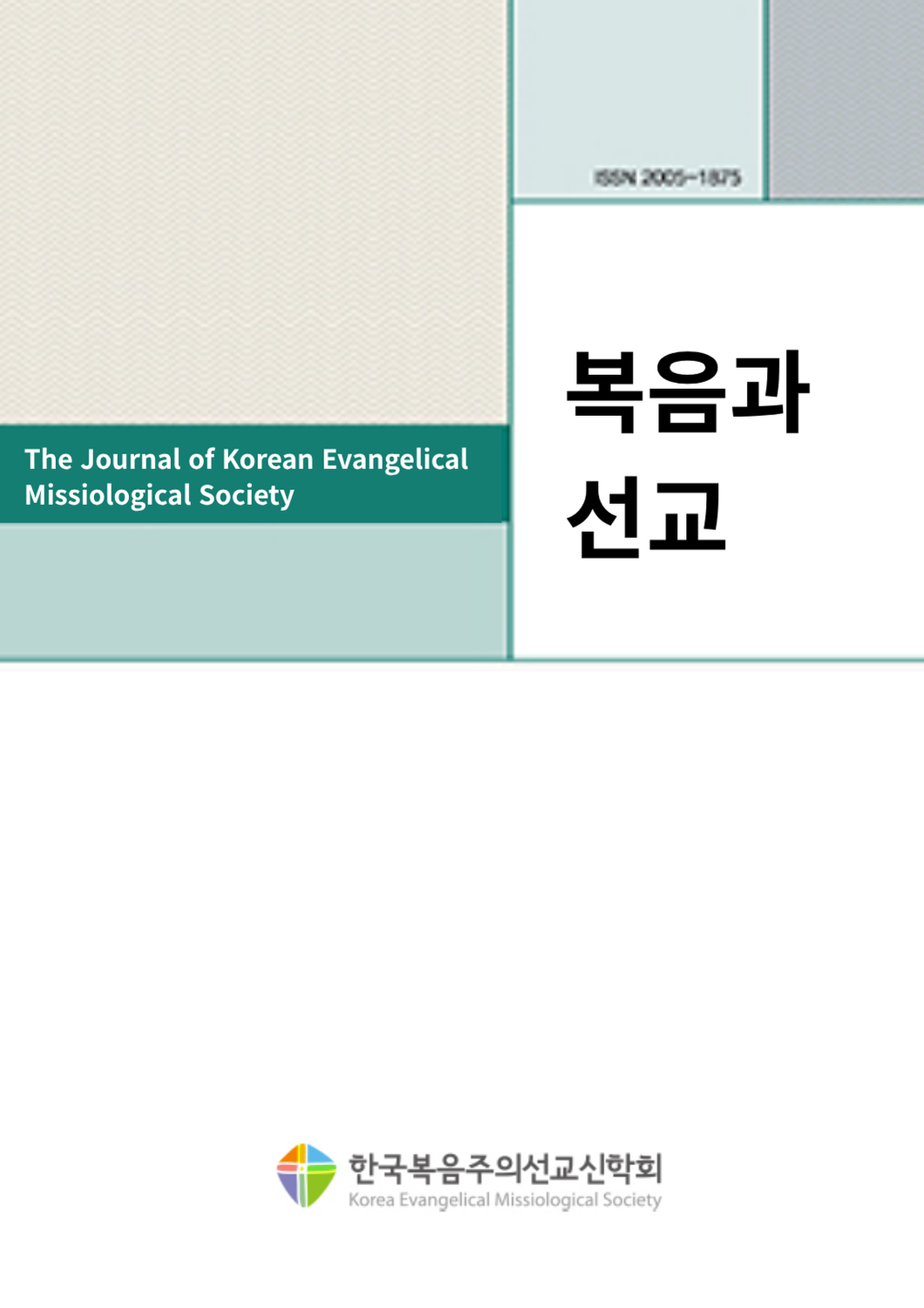선교적 해석학에 관한 대화: 규범과 다성성 사이의 길 찾기
서론: 하나의 사명, 두 개의 해석학적 긴장
21세기 교회의 핵심 과제인 선교적 해석학(missional hermeneutics)을 두고, 세 명의 저명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마이클 배럼, 존 프랭키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라이트의 The Great Story and the Great Commission과 배럼과 프랭키의 Liberating Scripture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논의는, 단순히 두 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선교적 성경 읽기의 근본적인 긴장을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통일된 규범적 서사(normative story)와 성경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polyphony) 사이의 창조적 긴장이다. 이들의 대화는 이 긴장을 신학적, 방법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탐색하며 현대 교회를 위한 귀중한 해석학적 지도를 제공한다.
1. 규범적 중심으로서의 '위대한 이야기' (크리스토퍼 라이트)
라이트는 단편적 성경 읽기를 비판하며, 성경 전체를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이 이야기를 7막 드라마로 구성하며, 그 핵심은 성경이 다양한 지류를 포함하면서도(다선형적, multilinear)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단방향적, unidirectional) ‘아마존 강 유역’과 같다는 것이다.
그의 선교 이해는 1984년 성공회의 '선교의 5대 표지'를 통합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정점을 이룬다. ①복음 선포, ②제자 양육, ③자비로운 섬김, ④정의 추구, ⑤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다섯 요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모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아래 하나로 묶인다. 이는 선교의 범위를 총체적으로 확장하며, 특히 창조 세계 돌봄을 선교의 본질적 사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
2. 다성성의 도전: 반대 서사와 실천적 맥락 (마이클 배럼 & 존 프랭키)
배럼과 프랭키는 라이트의 거시적 틀에 동의하면서도 두 가지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 내부적 도전 (텍스트의 다성성): 이들은 '위대한 이야기'가 성경 내의 작은 이야기들, 특히 반대 서사(counter stories)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프랭키는 ‘타락’ 중심의 서사 외에 ‘출애굽’과 같은 해방의 모티프가 성경을 관통하는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서사 구성의 유일성을 문제 삼는다.
- 외부적 도전 (해석의 맥락): 배럼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처럼 기독교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탈기독교 사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전제하는 서사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프랭키는 더 나아가, 신명기의 가나안 정복 명령 같은 폭력적 본문이 어떻게 현대의 기독교 민족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오용되는지를 고발하며 해석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다.
이에 대해 라이트는 성경의 거대 서사가 작은 이야기들에게 "햇빛 아래 자리"를 내주는 포용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역시 결정론이 아닌 '응답적 주권'이라고 답한다. 또한, 선교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지배적 서사(팍스 로마나, 미국의 꿈 등)와 복음 서사 간의 공적 대결이라고 주장하며, 어려운 본문은 성경 내의 수사적 장치와 자정 기능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 인식론의 심화: 복음의 객관성과 해석의 다원주의
대화는 『Liberating Scripture』를 중심으로 더 깊은 인식론적 차원으로 나아간다. 라이트는 이 책이 선교적 해석학을 '해석학적 자세'로 규정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두 가지 핵심 우려를 표명한다.
- 복음의 사건성(Kerygma) 문제: 해방 담론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복음 사건에 충분히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라이트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이다.
- 철학적 다원주의(Pluralism) 문제: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모든 해석을 동등하게 보는 다원주의는 무엇이 복음적인지를 분별할 규범적 기준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프랭키는 칼 바르트에 기반한 '비기초주의적 규범성'으로 응답한다. 인간의 모든 신학적 진술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한 '소문자 t 진리'에 불과하며, 성경조차 하나님의 은혜로운 '맞추심(accommodation)'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인간의 해석도 최종적일 수 없으며, 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목소리와의 대화를 통해 진리에 점근할 뿐이다. 이는 독단을 피하려는 인식론적 겸손이지만, 라이트가 우려하는 규범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낳는다.
4. 종합과 제안: '규범적 중심–개방적 둘레' 프레임워크
이 창조적 긴장을 생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이 대화는 "규범적 중심–개방적 둘레"라는 해석학적 틀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규범적 중심 (The Normative Center): 이는 라이트가 강조하는 지점들로 구성된다.
- 사건적 케리그마: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역사적·종말론적 사건이 해석의 기준점이다.
-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왕권이 선교의 모든 차원(다섯 표지)을 통합하는 중심축이다.
- 정경적 상호해석: 모든 부분 본문은 정경 전체의 맥락과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성 안에서 읽힌다.
- 십자가의 윤리: 타자를 지배하지 않는 자기 비움의 십자가 윤리가 모든 실천의 시금석이다.
- 개방적 둘레 (The Open Periphery): 이는 배럼과 프랭키가 강조하는 다성성의 공간이다.
- 다양한 서사 구성: 동일한 규범적 중심을 다양한 서사 틀(예: 출애굽-해방)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다.
- 상황적 적용: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은 성경을 새롭게 조명하고 적용하는 창의적 공간이 된다.
- 지속적 대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는 자신의 해석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수정한다.
이 틀 안에서 라이트가 제기한 '분별의 기준' 문제에 대한 답도 가능하다. 어떤 해석이 복음적인지는 ①그리스도론적 적합성, ②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실천, ③약자를 보호하고 지배를 거부하는 십자가 윤리, ④새 창조라는 종말론적 희망과의 부합 여부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
결론: 살아있는 대화로서의 선교적 해석학
세 신학자의 대화는 선교적 해석학이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성경을 씨름하며 읽어가는 살아있는 여정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Missio Dei)이라는 점, 선교의 통합성, 제국주의적 선교 비판이라는 근본적 합의 위에 서 있다.
라이트의 통합적 대서사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며, 배럼과 프랭키의 상황적 민감성과 인식론적 겸손은 그 여정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특히 포스트-기독교, 다원주의 사회, 그리고 기독교 민족주의의 위협 앞에서 이들의 균형 잡힌 접근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이 대화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없다"는 선교의 신비를 재확인한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독단을 피하고, 확신을 갖되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선포하면서도 땅의 작은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해석학이 우리를 초대하는 신실한 순종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