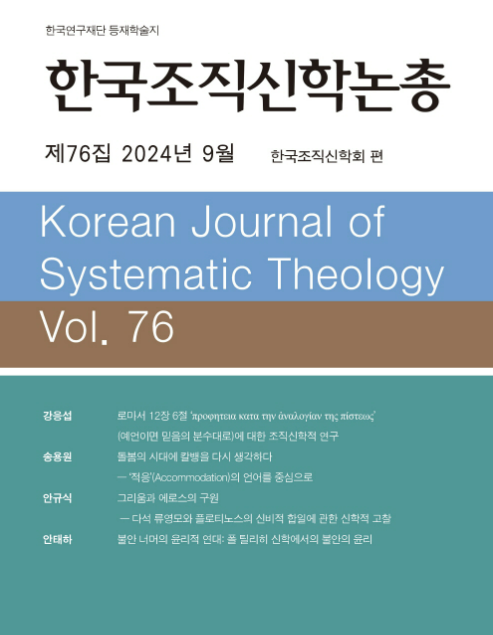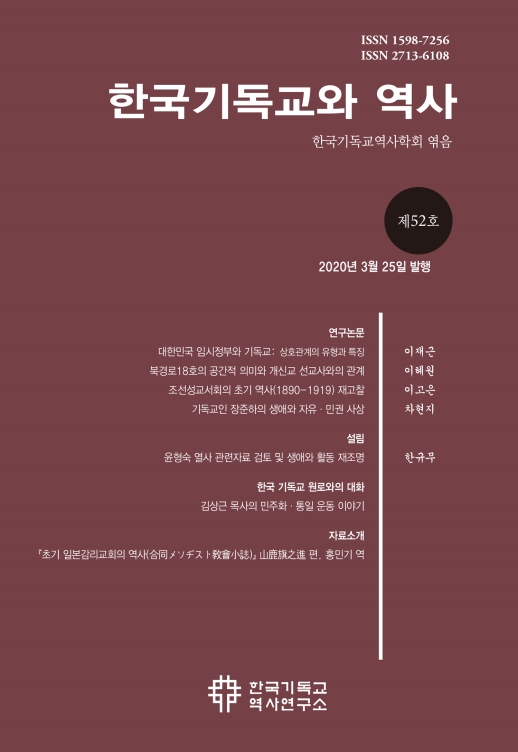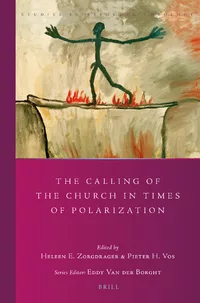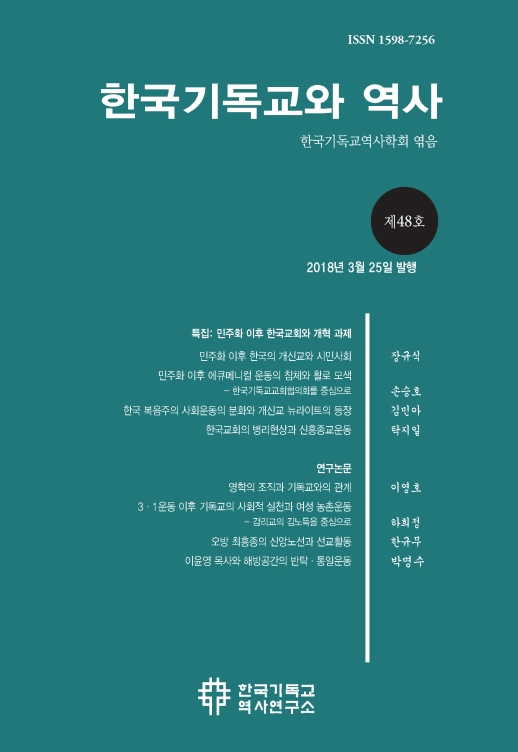I. 서론
16세기 대륙의 종교개혁의 물결은 영국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16세기 유럽 대륙 종교개혁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성찬론과 세례론을 중심으로 한 성례전 신학이었지만, 영국제도, 특히 잉글랜드에서는 이 논쟁이 신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예전과 의식의 문제로 나타났다. 토머스 크랜머 (Thomas Cranmer, 1489–1556)가 『공동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를 출판한 후, 예전과 아디아포라(adiaphora)에 대한 논쟁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 이러한 논쟁은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유럽 대륙으로 떠난 영국 제도의 피난민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혁가 존 녹스 (John Knox, 1514–1572)는 『공동기도서』가 충분히 개혁되지 않았으며 미신적인 의식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이를 거부했다. 그로부터 약 47년 후, 영국 국교회와 공적 예배를 변호한 리처드 후커 (Richard Hooker, 1554–1600)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Of the Lawes Ecclesiastical Politie라는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
녹스와 후커는 서로를 저작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에서 『공동기도서』와 잉글랜드 예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드러나고 있기에 이를 통해 연결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또 다른 공통점, 즉 칼빈주의라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칼빈의 영향을 받았고, 후커와 녹스 또한 그 가운데 하나였다.
두 사람을 칼빈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칼빈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들 모두 칼빈의 신학과 실천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녹스는 칼빈과 함께 했던 경험과 신학을 스코틀랜드에 소개한 후계자로 평가되며, 후커는 잉글랜드 국교회의 수호자로서 칼빈과 그의 신학에 대해 애정을 가진 태도를 견지했다.1) 예를 들어, 후커는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 서문에서 존경의 표현으로 칼빈에 대해 언급한다: “당신[청교도]의 규율은 훌륭한 창립자를 두었으며, 나의 개인적 견해로는 프랑스 교회가 그를 소유한 그 시점 이후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2) 이러한 이유로 후커가 칼빈주의자였는지, 혹은 반칼빈주의자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를 칼빈주의자로 보는 것도 여전히 합리적인 평가이다.3)
그러나 두 신학자는 특히 성경 해석과 공적 예배/예전에 있어 상당히 다른 신학적 입장과 실천을 가졌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칼빈주의자인 후커와 녹스가 『공동기도서』와 성경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가졌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 페이퍼의 논지는 두 사람을 향해 “칼빈주의자”라는 호칭을 붙이는 경향에 반해 이들은 칼빈의 성경신학/해석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이 차이가 공적 예배와 『공동기도서』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와 주장을 위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첫째, 16세기 『공동기도서』의 역사적 배경과 후커 및 녹스의 신학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두 사람이 성경 해석과 성경 권위에 대해 어떻게 다른 입장을 가졌는지를 비교한다. 셋째, 후커와 녹스의 성경적 의식 적용, 특히 성찬 의식에서의 자세(성찬상에서의 무릎 꿇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넷째, 이러한 논의가 선교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후커와 녹스의 다른 성경 해석과 접근법이 그들의 예전 신학과 적용 방식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 이것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공동기도서』를 둘러싼 논쟁
1547년,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면서 잉글랜드 교회에 여러 예전적 변화가 뒤따랐다. 이 개혁은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크랜머는 기존의 다양한 예전 전통들—Use of Sarum(Salisbury), York, Bangor, Lincoln 등을 종합하고, 라틴어 미사에 영어로 된 성찬 준비문을 삽입한 새로운 예전을 도입했다. 그러나 1549년 통일법Act of Uniformity을 통해 『공동기도서』가 출판되면서 라틴어 예전을 대체하게 되었다.4)
『공동기도서』는 1552년에 다시 한 번 크랜머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시점에서 크랜머와 스코틀랜드 개혁가 녹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녹스는 특정 자세와 의식들이 우상숭배적이며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 특히 그는 제단 앞에서 무릎 꿇기를 반대하며, 대신 식탁에 앉는 자세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식과 자세를 둘러싼 논쟁은 격렬했다. 『공동기도서』를 지지하는 자들과 이를 개정하려는 자들 모두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논쟁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이어졌다. 녹스는 개정파의 지도자로서, 『공동기도서』의 공동 저자인 리처드 콕스 (Richard Cox, 1500–1581)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녹스는 프랑크푸르트 시의회에 의해 추방당했고, 제네바로 이동해 칼빈의 목회 아래 머물게 되었다.
1559년, 메리 1세의 죽음과 엘리자베스 1세의 즉위 이후, 두 망명 집단은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던 중 녹스는 제네바에서 출판한 예배서 『기도의 형식』The Forme of Prayers를 가져왔는데, 이 책은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식 예배서로 승인되었다. 한편, 리처드 콕스는 엘리 주교로서 초기 엘리자베스 시대 잉글랜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의식과 『공동기도서』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듯 보였으나, 잉글랜드에서는 계속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국교회 지지자들과 청교도 비순응자들 사이의 논쟁이 이어졌다. 존 휘트기프트와 후커는 잉글랜드의 개혁된 예배와 『공동기도서』를 옹호한 반면, 토머스 카트라이트 (Thomas Cartwright, 1535–1603)와 월터 트래버스 (Walter Travers, 1548–1635)는 이를 미신적이고 혐오스럽다고 비판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존 휘트기프트 (John Whitgift, 1530–1604)와 케임브리지의 레이디 마가렛 신학 교수였던 카트라이트는 1572년부터 1577년까지 6년간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익명 저자의 『청교도 선언문』An Admonition to Parliament이라는 이름의 팜플렛으로 출판되어 촉발되었으며, 휘트기프트는 1572년에 『선언문에 대한 답변』Answer to the Admonition을, 카트라이트는 1574년에 『휘트기프트 박사의 답변에 대한 반론』Reply to an Answer Made of Master Doctor Whitgift을 거듭 발표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휘트기프트가 한 편, 카트라이트가 두 편의 추가 논문을 발표하며 논쟁이 심화되었다.
16년이 지난 1577년, 후커는 자신의 대표작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I–VI권이 1593년에 출판되었고, V권은 1597년에 출판되었다. 후커 사후인 1600년 이후에도 VI–VIII권은 각각 1648년과 1660년에 출판되었다.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 는 청교도들의 비판을 반박하기에 충분한 논거를 제공했다. 후커는 이 저작을 통해 청교도들의 공격으로부터 영국 국교회의 예배와 『공동기도서』를 방어했으며, 특히 V권에서 청교도들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Lee Gibbs는 후커의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 V권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책은 『공동기도서』에 있는 의식들이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덕목의 뿌리이자 질서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토대’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5) 17세기에도 『공동기도서』와 공적 예배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후커와 그의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는 영국 국교회의 예배를 방어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
III. 성경 해석과 성경의 권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조명은 칼빈의 성경 해석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홀”(God’s Sceptre)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왕이 자기 왕국을 다스릴 때, 그것은 왕의 통치가 아니라 강도의 행위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왕홀인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왕국에서 지속되는 번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6) 또한 칼빈은 성령의 역할을 성경의 교사로서 강조한다: “따라서 이 점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치신 이들은 진정으로 성경에 의지하며,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증명하므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리나 이성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7) 후커와 녹스 모두 이와 같은 칼빈의 성경 해석 기준과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방식은 같지 않다.
후커
후커의 16세기 개혁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그는 영국 신학의 아버지, 중용via media의 신학자, 국교회의 수호자 또는 엘리자베스 교회의 옹호자 등으로 불렸지만, 그를 "칼빈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O. T. Hargrave는 후커를 반(反)칼빈주의 전통에 포함시키는 반면, Henry Hammond는 그를 칼빈주의 진영에 속한다고 평가한다.8) 사실, 많은 2세대 혹은 3세대 개혁자들처럼, 후커의 신학은 특정 개혁자 한두 명에게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개혁자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다시 말해, 칼빈과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대륙과 영국의 개혁자들이 후커에게 영향을 주었다.
후커를 특정 전통에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고, 그의 신학에 대한 몇 가지 오해도 존재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이른바 “대륙 개혁주의 성경 신학” 또는 칼빈의 성경관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후커가 청교도들이 고수했던 성경의 전능성 교리(the doctrine of the Scripture’s omnicompetence)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Nigel Atkinson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오해를 지적한다. 두 가지 오해란, 첫째, “후커는 타락 교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칼빈은 성경의 만능성을 주장했다”는 주장이다. 앳킨슨은 이 두 진술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후커는 타락 교리를 부정하지 않았고, 칼빈 역시 성경의 전능성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9)
후커의 성경 신학과 성경 권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의 성경 해석학을 칼빈의 해석학과 비슷한 범주에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칼빈의 성경 해석학이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조명에 집중하듯이, 후커 또한 이 두 가지를 그의 해석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David Neelands에 의하면, 후커는 “성령의 증언이 우리 마음을 확신시켜 성경의 진리를 공급해준다”고 말하며 성경의 진리가 교회에서 갖는 일반적 권위의 기초가 된다고 인정한다.10)
후커는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이 교리를 이성의 권위와 연결시키는데, 이는 이미 칼빈의 신학 안에 암묵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존재하지만, 사실 칼빈은 이성을 자연적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으로 구분하며 인간이 여전히 자연법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문제에 대해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구분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구분이다: 지상적인 것들의 이해와 천상적인 것들의 이해는 다르다.”11) 앳킨슨은 “칼빈은 성경이 언급한 부분에서는 성경을 따랐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성이나 전통을 따랐다”며 후커가 칼빈의 해석학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12)
후커에게 이성은 성경을 확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원칙적인 역할을 한다.13) 그는 이성이 “성경에서 결과적으로 특정 교리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하며, 신학적 탐구와 논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믿었다.14) 성경의 권위와 이성의 상호작용은 후커 신학의 핵심 논점이다.
후커가 칼빈주의자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의 성경 해석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해는 칼빈의 접근과 비슷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의 예전 신학에 있어서 후커의 성경과 이성에 대한 관점은 중요하다. 후커는 청교도들이 『공동기도서』에 대해 제기한 불만에 맞서 이러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전제를 논리적, 수사적으로 사용했다.
녹스
녹스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칼빈주의자이자 칼빈의 진실한 후계자로 여겨져 왔다. 이는 두 개혁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굳건했기 때문이다. 녹스는 제네바를 “사도 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칭찬했고, 칼빈과 자주 서신을 교환하며 그의 조언을 구했다.15) 그러나 최근 학자들은 두 개혁자 사이의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녹스를 단순히 칼빈의 복사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Jane Dawson, Richard Kyle, 그리고 Richard Greaves는 칼빈과 녹스 사이의 많은 차이점을 확인했으며, 특히 이들의 차이는 성경 해석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관점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V. E. D’Assonville은 “녹스와 칼빈(그리고 루터)의 중요한 차이는 녹스의 성경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16) Richard Greaves 역시 녹스의 권위 교리가 칼빈의 그것과는 약간 다르다고 지적한다.17) 녹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다른 권위 위에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녹스는 이에 대해 결코 양보하지 않았으며, 그의 저작 전체에 걸쳐 이확신이 드러난다. 성령의 역할은 칼빈과 녹스 모두에게 중요했지만, 칼빈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강조한 반면, 녹스의 저작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브스가 지적하듯이, “녹스는 성경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며, 그 의미와 진리를 보증하는 내적 영적 증언에는 비중을 덜 둔다.”18)
녹스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바탕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칼빈이 성경의 문자와 실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것과 다르다. 특히 녹스는 신명기 12:32를 인용하며 성경의 실체보다 문자적 형식을 강조했다: “내가 잘 기억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되,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교를 측정할 기준이며, 그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19) 이러한 녹스의 해석은 그의 엄격한 문자주의적 성경관을 잘 보여준다. 그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만을 따라야 하며, 인간의 판단이나 해석을 더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는 후커가 이성과 전통의 역할을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었다. 이 입장을 바탕으로 녹스는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려 했으며,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예전은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며 악마의 예배”라고 선언했다.20) 이러한 문자주의적 해석은 칼빈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1561년 녹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충고한다: “의식에 관해서는 당신의 엄격함이 많은 이들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조절하기를 바랍니다.”21)
후커와 녹스는 모두 칼빈의 성경 해석학과 성경의 권위를 수용하고 발전시켰지만, 그 적용 방식은 상당히 달랐다. 후커는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조명을 이성과 연결했지만, 녹스는 성경의 문자적 형태와 절대적 적용을 강조하며 성령의 역할에는 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예전 신학, 특히 『공동기도서』에 대한 견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
IV. 『공동기도서』와 제단 앞에서의 무릎 꿇기에 대한 두 관점
칼빈의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후커와 녹스 모두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인정되었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점에 강조를 두었다. 후커가 성경의 최고의 권위와 성령의 역할을 인정한 반면, 녹스는 성경의 문자적 형식과 그것의 전능성(scriptural omnicompetence)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공적 예배에 대한 그들의 예전 신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공동기도서』에 대한 태도에서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 섹션에서는 두 사람의 성경적 접근과 예전 신학을 연결 짓기 위해 성찬에서의 성찬상 앞 무릎 꿇기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후커
『교회 체제의 법에 관하여』 IV권과 V권에서 후커는 청교도들이 문제 삼았던 몇 가지 예식과 성례전 집행을 변호한다. 청교도들은 “여성에 의한 세례,” “유아에 대한 질문과 대부모godparents의 답변,” “세례에서 십자가의 표식을 사용하는 것,” “주교에 의한 견진례,” “예수의 용법인 ‘ye’대신 단수형 ‘너(thou)’를 사용하는 것,” “성찬에서 무릎 꿇기,” “성찬 전 공동체의 자기 점검의 부족,” “가톨릭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일부 공동체만 성찬을 받는 것,” “사적인 성찬” 등을 비판했다. 후커는 이 비판에 대해 각각의 성례전과 예식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한 후 하나하나 반박한다.22)
청교도들이 제기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성찬에서의 자세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오래된 역사와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커의 시대에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다. IV권에서 후커는 이 논쟁을 간략히 소개한다. “어떤 교회는 성찬을 앉아서 받는 것이 서서 받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고, 또 다른 교회는 서서 받는 것이 앉아서 받는 것보다 낫다고 여긴다.”23)
V권 68장에서 후커는 토머스 카트라이트의 비판을 언급하며 시작한다. 카트라이트는 “우리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자세 때문이다. 무릎을 꿇는 행위에는 미신이 있다. 앉아서 받는 것이 식사의 행위에 더 잘 어울리며, 우리 구주께서 가장 적절한 자세를 취하셨는데 그분 자신도 무릎을 꿇지 않으셨다.”24) 카트라이트는 또한 “무릎 꿇기는 경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앉아서 받는 것이 식사의 행위에 더 잘 어울린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25)
이에 대해 후커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우리의 성찬에서 무릎 꿇기는 경건의 자세이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영적 만찬의 형식을 보이거나 형식적으로만 행한다면, 앉아서 받는 것이 더 적절한 의식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자로서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시간에 우리의 몸이 진정으로 겸손해진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우리 주님께서는 오랜 관습과 사용에 의해 적절해진 것을 행하셨고, 우리는 적합함과 큰 품위를 통해 보편화된 것을 행하는 것이다.”26)
이 짧은 반론에서 후커의 입장은 분명하고 논리적이다. 후커에게 성례전은 개인적 참여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어주시는 수단이다. 닐랜즈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무릎 꿇기는 성찬에 적합한 자세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잔치 이상의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는다.”
더욱이 이 구절은 그의 성경의 권위와 이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후커의 의도대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5권의 이전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와 다르게 행한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글자들에 스스로를 엄격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로부터 영감받은 그 신성한 지혜를 따르는 것인데, 이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치며, 이로써 위대한 선례들을 따르는 데 있어 작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유익한 방법을 비난하는 자들의 대담함을 통제한다.”
후커는 성경의 권위나 개혁파 성경해석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성경의 권위와 이성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전제를 이 성찬 의식에 적용한다. 그는 성경에서 도출되고 “교회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Church”에 의해 지지되는 의식이나 정책의 합리적 적용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고 보았다:27) “성경이 명백히 전하는 바에 첫 번째 신뢰와 순종이 주어져야 한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이성의 힘으로 필연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다음에 교회의 목소리가 따른다. 교회가 그 교회적 권위로 참되거나 선하다고 개연적으로 생각하고 정의하는 것은, 이성의 조화 속에서 다른 모든 하위의 판단들을 지배해야 한다.”28)
성경의 권위와 이성이 후커의 예전과 예배에 대한 생각에서 유일한 요소들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의 성경적 관점이 그의 예전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건덕 등, 후커의 신학에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들이 검토되고 비교되어야 하지만, 후커가 자신만의 성경적 관점을 발전시켜 공적 예배와 특정 의식들을 옹호하는 데 적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29)
녹스
예배와 예전과 관련된 그의 저작들 중 “미사의 희생이 우상숭배라는 교리에 대한 변호”A Vindication of the Doctrine that the Sacrifice of the Mass is Idolatry라는 설교는 녹스의 예전 신학과 그것이 성경 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텍스트 중 하나이다. 이 설교에서 녹스는 거짓되고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규명하기 위해 두 가지 삼단논법을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의 종교 안에서 인간의 머리로 발명된 예배, 경배, 또는 섬김은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상숭배이다. 미사는 인간의 머리로 발명된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우상숭배이다. ... 둘째,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데 사악한 의견이 추가된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미사에는 사악한 의견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30) 녹스에게 우상숭배 예배를 정화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다. 많은 새로운 예배서들, 특히 『공동기도서』와 칼빈의 『기도와 교회의 찬송의 형식』La forme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uques이 있었지만, 녹스는 그 책들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보다 더 개혁되고 성경에 철저히 기반한 예배서를 원했다.
그는 처음에는 『공동기도서』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졌고 사용도 하였지만, 결국 비판적으로 변했다. 그는 1555년 3월에 칼빈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동기도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다: “제가 영국의 기도서에서 (그들이 다른 예배서들보다 더 높이 칭찬하는 그 책에서) 미신적이고 불순하며 불완전한 부분들을 발견했기에 우리 교회에서 그 책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누구와도 논쟁을 통해 입증하고자 준비된 바입니다.”31)
녹스의 비판은 주로 성찬에서의 무릎 꿇기 자세에 집중되었다. 그는 이 자세가 미신적이고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녹스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주님의 만찬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토머스 크랜머, 니콜라스 리들리Nicholas Ridley(1500–1555) 및 다른 개정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공동기도서』의 개정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려 했다.
녹스는 1552년 베릭에서 자신의 회중에게 『공동기도서』에서의 무릎 꿇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주님의 만찬에서 무릎 꿇는 행위는 식탁의 행위에 적절하지 않으며,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자세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릎 꿇는 행위는 미신을 유지하려는 위험을 동반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정을 다른 자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앉아서 받는 것이 합당하며, 여러분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에 감사하며 이 교리를 자세와 고백으로 확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32)
녹스는 또한 추밀원Privy Council에 제출한 다른 문서에서도 올바른 성찬의 자세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33) “무릎 꿇기는 대개 간청하는 자들, 거지들, 혹은 자신의 비참함이나 죄를 깨닫고 도움이나 용서를 구하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입니다.”34) 이러한 입장은 녹스가 주님의 만찬에서의 앉아서 받는 자세를 성경적이라고 확신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를 옹호하면서, 앉아서 받는 것이 성경에서 명시된 예식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었다.
녹스는 마침내 에드워드 6세와 왕실이 참석한 윈저 성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었다. 이 설교에서 그는 주님의 식탁에서 앉아서 받는 자세를 성경적으로 올바른 자세로 주장했다. 이 설교의 결과로 추밀원은 인쇄 중이던 기도서의 제작을 중단시키고 몇 가지 수정을 지시했다. 이 사건의 긴급성은 새로운 『공동기도서』가 11월 1일 영국 전역에 도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35) 크랜머와 녹스는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으며, 짧지만 격렬한 논쟁 끝에 의회는 최종판 『공동기도서』에 각주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바로 “검은 각주”Black Rubric이다.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새 기도서의 초판이 이미 인쇄되었기 때문에 이 면책 조항은 별도로 인쇄되어 기존의 책에 삽입되어야 했다. 이러한 예전 지침은 일반적으로 붉은 잉크로 인쇄되었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 잉크가 사용되어 ‘검은 각주’로 알려지게 되었다.”36)
녹스는 1556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추방당한 후 동료 망명자들과 함께 『기도의 형식』을 작성했으며, 이 책에도 성찬에 대한 그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권면이 끝나면 목사는 강단에서 내려와 식탁에 앉고, 모든 남자와 여자도 가장 적합한 자리에 앉는다. 그 후 그는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다음의 말이나 이와 같은 효과의 말을 한다.”37)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의 저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식탁에 가져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면서도 앉아서 받는 것은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녹스가 『공동기도서』의 무릎 꿇기를 미신적 자세로 여기고 이를 거부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후커와 녹스는 모두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칼빈의 성경 해석학을 공유하지만, 그들의 관점과 적용 방식은 다르다. 후커는 성경의 권위, 이성, 그리고 교회의 목소리를 결합하여 무릎 꿇기를 합당한 예식으로 보았지만, 녹스는 성경의 문자적 형식과 그것의 만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무릎 꿇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차이는 그들의 예전 신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성찬에서의 자세에 대한 논쟁은 이들의 서로 다른 성경 해석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V. 선교적 해석학 관점에서의 함의와 적용
지금까지 살펴본 후커와 녹스의 성경 해석과 예전적 적용의 차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선교적 함의를 제공한다. Christopher Wright가 주장하듯이, 성경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문서이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증언한다. David Bosch는 이러한 선교적 관점을 “선교에 대한 변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며, Leslie Newbigin은 복음과 문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되는 선교적 실천을 강조한다.38) 라이트는 “선교적 해석학”을 통해 성경이 단순히 선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교적 내러티브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후커와 녹스의 성경 해석과 예전적 적용은 16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라는 특정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선교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Dean Flemming의 문화적 상황화 이론은 이러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플레밍은 Contextualization in the New Testament: Patterns for Theology and Mission에서 바울의 문화간 소통 전략을 분석하며,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바울은 문화적 다리놓기(cultural bridge-building)를 통해 복음의 상황화를 실천했으며, 이는 문화적 맥락에 민감하면서도 복음의 변혁적 성격을 유지하는 균형을 보여준다.3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후커의 접근은 잉글랜드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상황화의 좋은 예시로 볼 수 있다. 후커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성과 전통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잉글랜드의 문화적, 지적 전통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반면 녹스의 엄격한 문자주의적 접근은 스코틀랜드의 급진적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적 단절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Richard Bauckham은 성경 해석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보컴의 선교적 해석학은 성경 전체를 선교를 중심 관심사로 읽는 방식을 제안한다. 보컴에 따르면, 성경 해석에는 본문의 원래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현대적 적용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움직인다고 보며, 이는 하나님이 특정 개인이나 민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이에게 알려지게 하신다는 개념이다.40) 또한 보컴은 성경을 현대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과 연결 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후커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성과 전통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보컴의 균형 잡힌 접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녹스는 성경의 원래 맥락과 권위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이는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가 필요로 했던 급진적 개혁의 맥락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들은 현대 교회의 예배와 선교적 실천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상황화될 수 있으며, 이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후커의 성경 해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이성과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예전적 접근은 전통적 예배 형식이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문화적 상황화는 때로는 녹스와 같은 급진적 개혁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문화적 형태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가리는 경우, 과감한 단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세계 교회가 직면한 예배의 상황화 문제에서도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교회에서의 조상 제사 문제는 녹스의 엄격한 접근과 후커의 문화적 유연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한국 교회에서는 추도식과 차례예식의 기독교적 대안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긴장이 명확히 드러난다.42) 또한 아프리카 교회에서 전통 의례의 요소들을 기독교 예배에 통합하는 문제도 한 예가 될 수 있다.43)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 예배 형식과 현대적 감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후커의 접근은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문화적 적절성을 추구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반면 녹스의 접근은 때로는 과감한 문화적 혁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선교적 실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플레밍이 지적하듯이, 문화적 상황화는 단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후커와 녹스의 서로 다른 접근은 각각의 맥락에서 나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가졌다. 이는 오늘날 세계 교회가 처한 다양한 맥락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는 후커와 같은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이, 다른 맥락에서는 녹스와 같은 급진적이고 단절적인 접근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후커와 녹스의 사례는 성경 해석과 예전적 적용이 선교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차이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각각의 문화적 맥락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현하려는 선교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예배의 상황화와 선교적 실천의 문제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VI. 결론
이 연구는 16세기 영국의 예배 논쟁을 선교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 교회의 선교적 상황화를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후커와 녹스의 해석학적 차이는 단순한 역사적 논쟁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화적 상황화와 성경 해석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를 통해 논의된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 해석에 있어서 후커와 녹스는 모두 칼빈의 해석학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후커는 이성과 전통의 역할을 인정하는 유연한 해석학을 발전시켰고, 녹스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와 직접적 권위를 강조하는 엄격한 해석학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방법론적 차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를 반영한다.
둘째, 이러한 해석학적 차이는 예배의 실천적 측면, 특히 성찬식에서의 자세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후커의 경우 무릎 꿇기의 문화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구분하며 상황적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녹스는 성경적 단순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며 문화적 혼합을 경계했다. 이는 오늘날 예배의 상황화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선교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개혁자의 접근은 각각 현대 교회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후커의 접근은 문화적 참여와 상황화의 중요성을, 녹스의 접근은 성경적 순수성 유지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현대 교회는 이 두 가지 관점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보컴의 보편적 관점과 플레밍의 상황화 이론은 후커와 녹스의 논쟁을 재해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가 직면한 선교적 과제들을 다루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성경의 보편적 메시지가 어떻게 특수한 문화적 맥락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역사적 논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선교적 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역사-선교적 접근은 교회사 연구가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닌, 현대 교회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커와 녹스의 신학적 긴장은 현대 교회가 문화적 참여와 성경적 신실성 사이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이들의 논쟁을 통해 우리는 상황화가 단순히 문화적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지혜를 요구하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이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 특히 각 문화권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를 비롯한 타 대륙의 다종교적, 다문화적 상황은 서구와는 다른 도전을 제기하며, 이는 후커와 녹스의 통찰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관심사가 아니라 현대 교회의 선교적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미주
- David Neelands, “The Use and Abuse of John Calvin in Richard Hooker’s Defence,” in Between the Lectern and the Pulpit, ed. Rob Clements and Dennis Ngien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2014). 후커를 칼빈주의자로 보지 않는 주장에 관해서는 A. J. Joyce, Richard Hooker and Anglican Moral Th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56을 참고하라. ↩
- Richard Hooker, The Lawes of the Ecclesiasticall Politie, Preface 2.1; The Folger Library Edition of the Works of Richard Hooker (이하 FLE), 1:3.13–15. All references to the Lawes cite book, chapter, and section followed by the standard FLE citation. References to FLE cite volume, page, and line numbers. ↩
- Neelands, “The Use and Abuse of John Calvin in Richard Hooker’s Defence,” 41–57. ↩
- Bryan D. Spinks,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London: SCM Press, 2013), 313. ↩
- Lee W. Gibbs, “Life of Hooker,” in A Companion to Richard Hooker, ed. Torrance Kirby (Leiden: Brill, 2008), 16; Lawes 5:1.1; FLE 2:16.1. ↩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and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Preface. Hereafter this reference will be cited as Institutes, followed by the appropriate book, chapter, and section. ↩
- Institutes, I, vii, 5. ↩
- O. T. Hargrave,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the English Reformation (unpublished PhD thesis, Nashville, Tennessee: Vanderbilt University, 1966), 228-234; Henry Hammond, Charis kai eirēnē, or, A pacifick discourse of Gods grace and decrees in a letter of full accordance, 9–10. ↩
- Nigel Atkinson, Richard Hooker: The Authority of Scripture, Tradition, and Reason (Carlisle, Cumbria: Paternoster Press, 1997), 78-79. 앳킨슨은 성경의 전능 교리를 “모든 행동에 대해 성경적 보증을 요구하는 성경관”이라고 정의한다. ↩
- Neelands, “The Use and Abuse,” 47–48; Lawes, III. 8. 15; FLE 1:232.33–233.9 ↩
- Institutes, II, ii, 13. ↩
- Atkinson, Richard Hooker, 79. ↩
- Nigel Voak, “Richard Hooker and the Principle of Sola Scriptura,”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9, no. 1 (April 2008): 135. ↩
- Voak, “Richard Hooker and the Principle of Sola Scriptura,” 101. ↩
- John Knox, The Works of John Knox, collected and edited by David Laing (Edinburgh: Thomas and George Stevenson, 1854–64), 4:240. Hereafter this reference will be cited as Works followed by the appropriate volume and page number. ↩
- V. E. D’Assonville, John Knox and the Institutes of Calvin: A Few Points of Contact in Their Theology (Durban, SA: Drakensberg Press, 1969), 69. ↩
- Richard L. Greaves, “The Nature of Authority in the Writings of John Knox,” Fides et historia 10, no. 2 (Spring 1978): 30–51. ↩
- Greaves, “The Nature of Authority,” 46. ↩
- Works, 1:197. ↩
- Works, 4:231. ↩
- Works, 6:124. ↩
- David W. Neelands, “Christology and the Sacraments,” in A Companion to Richard Hooker, ed. Torrence Kirby (Leiden: Brill, 2007), 369. ↩
- Lawes, 4.13.8; FLE 1:333.15–17. ↩
- Lawes, 5.68.1; FLE 2:344.9–12. ↩
- Lawes, 5.68.3; FLE 2:346.i. The full passage is found in FLE 6:771. ↩
- Lawes, 5:68.1; FLE 2:345.17–24. ↩
- Lee W. Gibbs, “Richard Hooker’s via Media Doctrine of Scripture and Tradition,” Harvard Theological Review 95, no. 2 (April 2002): 234 ↩
- Lawes 5:8.2.; FLE 2:39.8–14. ↩
- Bradford Littlehjohn은 '교회의 건덕'은 전례와 예식에 관한 후커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W. Bradford Littlejohn,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Richard Hooker’s Theology of Worship and the Protestant Inward / Outward Disjunction,” Perichoresis 12, no. 1 (2014): 3–18을 참고하라. ↩
- Works, 3:34; 3:52. ↩
- Works, 4:44. ↩
- Peter Lorimer, John Knox and the Church of England: His Work in Her Pulpit and His Influence Upon Her Liturgy, Articles, and Parties (London: Henry S. King & Co., 1875), 261. ↩
- 이 글의 저자가 녹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Iain R. Torrance는 “거의 확실하게 녹스”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그의 글, “A Particular Reformed Piety: John Knox and the Posture at Communio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7, no. 4 (2014): 400–413을 참고하라. ↩
- Lorimer, John Knox and the Church of England, 271. ↩
- Jane E. A. Dawson, John Knox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15), 73. ↩
- Alan Jacobs, The Book of Common Prayer: A Biograph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54. See also MacCulloch, Thomas Cranmer, 527. ↩
- Works, 4:194. ↩
-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Books, 1991), 349–367.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141–154. ↩
- Dean Flemming, Contextualization in the New Testament: Patterns for Theology and Miss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5) 89–125. ↩
- Richard Bauckham, Bible and Mission: Christian Witness in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11–26. ↩
- Richard Bauckham, The Bible in the Contemporary World: Hermeneutical Ventures (Grand Rapids: Eerdmans, 2015), 5–17. ↩
- 문옥표, “한국인의 가정의례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제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79 (1998): 157–169. ↩
- Kwame Bediako, Christianity in Africa: The Renewal of Non-Western Relig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5), 104–125. ↩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