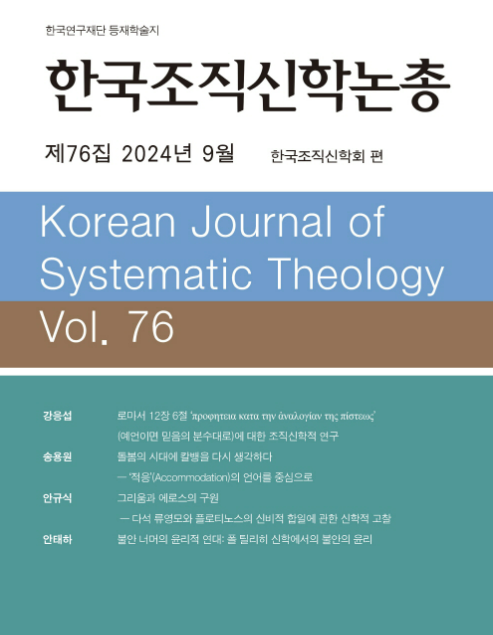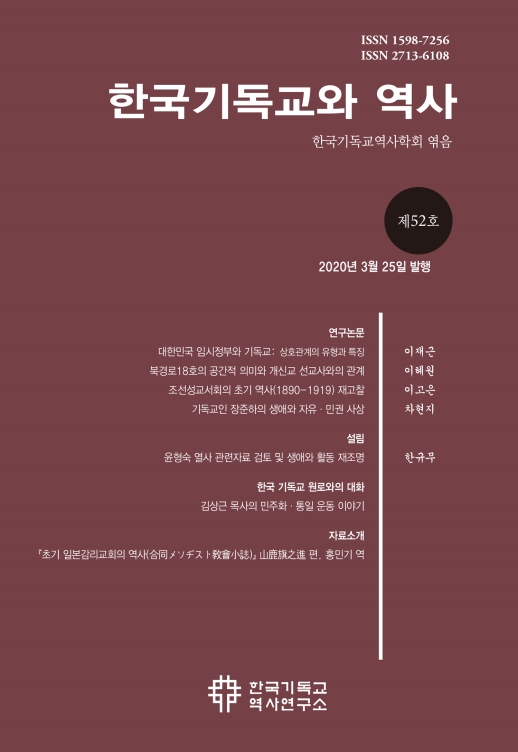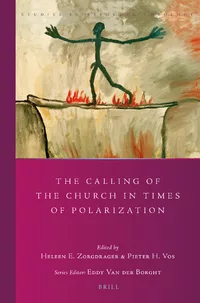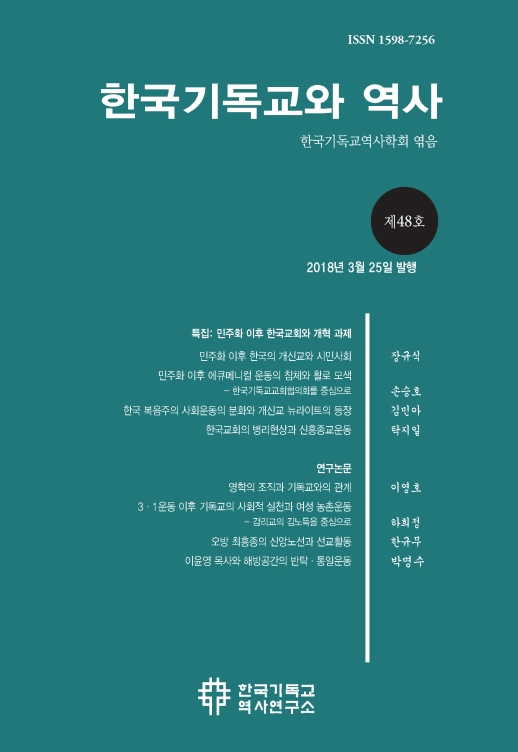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는 위트레흐트 대학교 교수로서 제2종교개혁(Nadere Reformatie)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로마 가톨릭, 아르미니우스주의, 소시니안주의 등 다양한 신학적 도전에 맞서 개혁파 신학을 변론하고 체계화해야 하는 시대에 활동했다. 기존 연구는 주로 푸치우스가 신학과 철학을 분리하는 데카르트주의를 비판하며 신학 중심의 학문적 통합을 추구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그가 '학식 있는 무지'(docta ignorantia) 개념을 통해 지적 겸손과 경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푸치우스에게 '학식 있는 무지'가 단순한 겸손의 덕목을 넘어 그의 신학방법론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포괄적이고 지시적인 개념이었음을 논증한다. 푸치우스는 이 개념을 통해 무지함을 아는 반성적 이해와 학식 있는 앎을 동시에 추구했다. 그에게 이것은 인간 지성의 한계를 깨닫되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배움을 추구하는 역동적 원리였다.
본 연구는 『신학 논쟁 선집』(Selectarum disputationum theologicarum, 1659)과 『신학 및 거룩한 문헌학, 역사학, 철학에 대한 담론집』(Diatribae de theologia, philologia, historia & sacra; philosophia, 1668)을 중심으로 푸치우스의 신학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신학함 자체에서 '학식 있는 무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핀다. 푸치우스는 신학을 다의적으로 정의하며 인간들의 일상적 신학(theologia ordinaria hominum)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삼위일체나 하나님의 작정처럼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신학적 주제들에서 겸손한 고백을 권면했지만, 동시에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학을 사변적이기보다 실천적 학문으로 정의하며, 설교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성도를 가르치지 말고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둘째, 신학을 위한 보조 학문 사용에서 '학식 있는 무지'의 적용을 분석한다. 푸치우스는 철학, 특히 형이상학과 논리학이 신학의 시녀로서 유용하다고 보았지만, 신학이 초자연적 계시인 성경을 원리로 하는 제1의 독립적 학문임을 강조했다. 그는 라무스주의자들의 형이상학 비판을 경계하며 철학의 유용성을 옹호했지만, 동시에 철학이 신학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문헌학에서는 성경 본문 연구를 위해 히브리어, 그리스어뿐 아니라 콥트어, 페르시아어, 에티오피아어까지 공부할 것을 권면했으나, 동시에 독창성을 추구하거나 성급한 비평으로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역사학에서는 자연사, 교회사, 성경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신학 연구를 위한 배경 지식을 쌓을 것을 권했지만, 성경 외 자료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본 연구는 '학식 있는 무지'가 푸치우스에게 있어 지적 나태가 아니라 '학식 있는 앎'과 함께 적극적 학문 탐구를 촉진하는 개념이었음을 밝힌다. 이것은 호기심과 지적 교만이라는 양극단의 죄를 피하며, 성경의 권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론적 기초였다. 이를 통해 푸치우스는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가 추구한 교리의 정확성과 경건의 실천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려 했다. 본 연구는 푸치우스의 신학방법론이 단순한 반데카르트주의를 넘어, 학문적 통합과 영적 성숙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비전이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 학식 있는 무지; 학식 있는 앎; 신학방법론; 신학과 철학; 개혁파 정통주의; 제2종교개혁; 데카르트주의 비판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