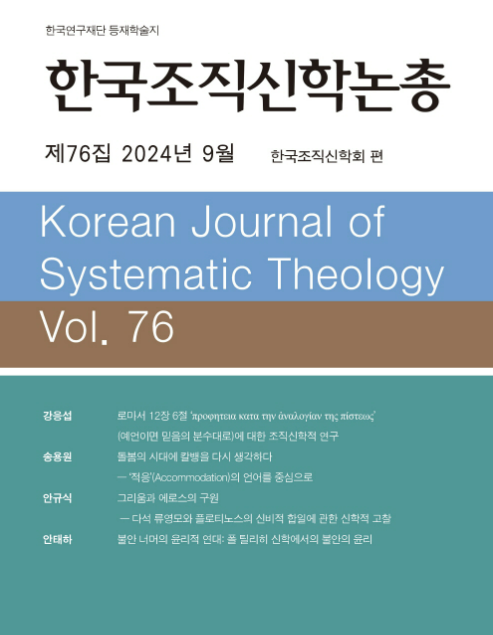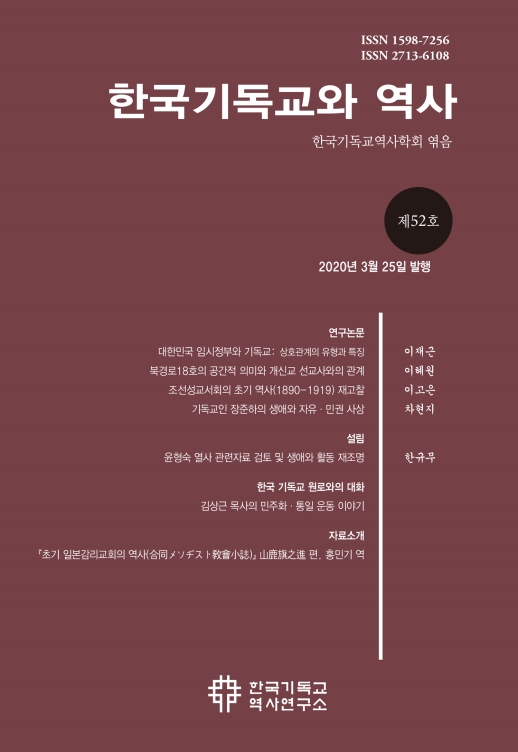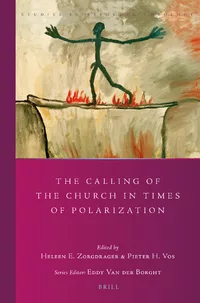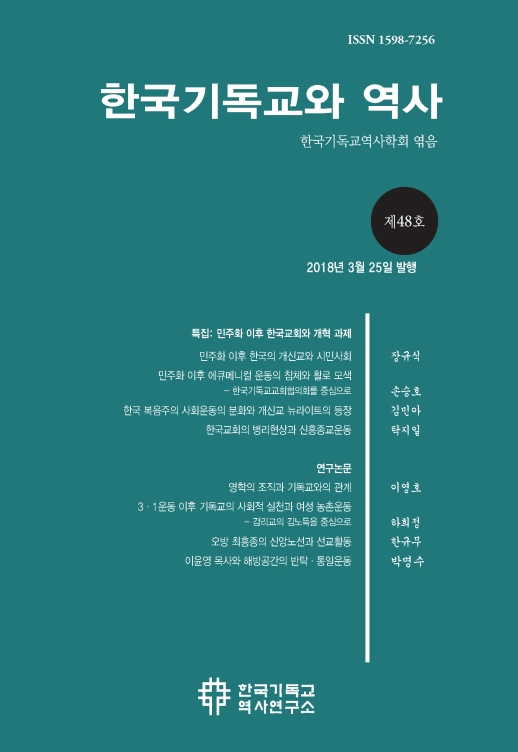1. 선교적 신학의 근간이 되는 두 주제
선교적 신학은 아주 구체적인 신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기본이 된다. 가장 적절한 예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들 수 있다. 라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이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라이트는 성경 전체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선언하며 독자들을 설득한다.[1]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뜻하시며,[2] 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왕으로 다스리신다.[3]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동일하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의무이자 특권이 있었고, 나머지 피조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임무, 곧 선교라는 사명이 주어졌다.[4]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자, 소유자, 통치자, 판사, 계시자, 사랑하는 자, 구원자, 지도자, 화해자로 드러내셨고, 온 세상이 이런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다.[5]
라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 받기를 원하셨다. 신약 교회는 이러한 선교를 자기 사명으로 삼았다.[6] 라이트는 이를 종합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추진된다.”[7] 따라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우리의 모든 선교적 노력은 하나님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는 선행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뿐이며,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동시에 위로를 준다.”[8]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요약할 수 있다. 선교적 신학을 바르게 확립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 일이 핵심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신론이라는 탄탄한 교리를 기둥 삼아 선교적 신학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셔널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으니, 바로 고난이다. 마이클 고힌은 선교가 고난을 동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교라는 맥락에서 만날 때,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신자가 바른 선교를 염두에 두고 타자를 대할 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가 복음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 때, 그러한 행동은 기존의 방식을 뒤집으려 한다. 현 체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는 선교할 수 없다. 신자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권력에 도전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고난과 갈등을 가져온다. 고힌에 의하면, 사도행전 교회에서 이러한 고난의 필수 불가결성이 현저히 드러난다 (행 14:22).[9]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고힌에 의하면, 선교에 대한 열정과 충실함은 반드시 고난을 가져온다. 나아가 이 충실함은 강인한 영성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세상 위에서 군림하며 부족한 세속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다. 사실 이제는 교회가 앞서 나가며 부족한 속세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경우가 지극히 적다. 앞서 나가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선교로 인해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저항하여 싸우는 선교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와야만 한다고 고힌은 시사한다.[10]
2. 신론과 고난의 긴밀한 관계
그렇다면 이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은 어떻게 연결될까? 선교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참여하는 행위라고 한다고 하자. 그리고 선교는 고통을 수반해야만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선교하시는 하나님 역시 고통 받으셔야 하지 않는가? 선교라는 행위에 본질적으로 고통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에게 고통이란 불가분리의 요소라고 보아야만 한다. 두 주제는 분명 논리적으로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 두 퍼즐 조각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선교적 신학에서 과연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중요한 선교적 신학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먼저 라이트는 고통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는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고통의 주체로 삼지는 않는다. 라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분이시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전한 승리를 마무리 지으셨을 때,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며 기뻐할 것이다.[11] 그렇다고 하나님이 신자의 고난에 대해 무지하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라이트는 하나님이 고난 받고 박해 받고 억압 받는 자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런 자들을 위해 늘 일하고 계심을 강조한다. 하지만 라이트에게 있어 중요한 지점은 “구조”와 “구원”이다. 이 땅에서 억압 받는 사람을 구해주시는 행위,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에 방점이 찍혀 있다.[12]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지만, 그 고난은 이 구조와 구원이라는 틀에서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선교가 핵심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13]
그렇다고 선교적 신학에 있어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스티븐 테일러(Stephen Taylor)는 “고난의 선교적 해석”에서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과 선교적 신학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묘사했다. 테일러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던 그 처음부터 고난을 감수할 준비를 하셨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고통을 견디시고, 결국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 주셨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직접 들어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난의 가능성을 갖고 계셨고, 또 고통 받으셨으며, 따라서 인류의 고난, 교회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14]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고통 받으셨고, 계속 고난 받고 계시며, 앞으로도 괴로워하실 것이다.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십자가 위에서 역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쏟아졌다.”[15]
테일러의 기여는 실로 유용하다. 앞서 언급했던 신론과 선교적 신학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과 선교의 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이어주었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그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나아가 고난 받는 하나님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학적으로 섬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었던 점 역시 작은 유감으로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의 본 연구는 테일러가 했던 기여를 확장하고 연장하고자 한다. 테일러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과연 괴로워하실 수 있는가? 전능하신 창조자께서 어떻게 고통 받으실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칼뱅의 목소리를 빌리고자 한다. 선교적 신학이 정통 신학과 공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간혹 등장하는데, 개혁파 정통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로 꼽히는 칼뱅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 무어라 이야기할까? 라이트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창조자, 재판자, 통치자, 사랑하는 자, 구원자 등으로 계시하시며 선교하셨다고 하는데, 필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괴로워하는 자라고 드러내신다고 주장하려 하며, 이를 통해 선교와 고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3. 칼뱅이 말하는 하나님의 감정적 고난
가장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지점이 있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 없으시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하나님의 본성을 논의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심을 분명히 한다.[16] “하나님께는 피가 없고, 고난당하지 않으며, 손으로 만질 수 없다.”[17]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주먹으로 맞거나 칼에 찔릴 수 없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무력화하거나 죽일 수 없다.
따라서 칼뱅 연구에서 논쟁이 되는 지점은 하나님의 감정적 고난이다. 많은 학자들이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감정적 고난은 단지 비유적 표현이자 “하나님의 적응”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신다는 주장이다. 하나님이 “실제로는” 괴로워하실 수 없다고 해석하는 칼뱅 학자들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칼뱅은 종종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고난당한다고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부터 세 가지 방식으로 칼뱅이 고통 받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습을 그려보겠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순종하며 선 대신 악을 행할 때 고통을 받으신다. 칼뱅은 이사야 43장 24절을 주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과 경외로 순종하는 대신 반역으로 하나님께 불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들의 죄로 인해 지치셨다고 설명한다. 칼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 통치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큰 슬픔을 느끼셨다고 말한다.[18]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칼뱅이 이 고통을 단순히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을 표현하는 비유적 언어로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칼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실제로 큰 슬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대한 칼뱅의 주석도 비슷한 생각을 드러낸다. 이 구절을 해석하며 칼뱅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반역과 악행으로 하나님을 “찔렀다”고 쓴다.[19] 물론 칼뱅은 이 “찔렀다”는 표현을 비유로 사용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찔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유가 가리키는 바는 분명하다. 칼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도발”했다고 해석하며, 이스라엘의 악이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격동”시켰다고 말한다.[20] 이들의 악행은 마치 하나님을 찌르는 것처럼 지속적인 격동, 도발(irritatio)의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감정의 변화와 고통을 의미한다.[21]
칼뱅의 아모스 2장 13절 주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악행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고통받으신다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 이 구절에서 칼뱅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비유로 짐수레라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짐수레인 것은 아니지만, 칼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과도한 짐을 실은 수레처럼 “신음”하셨다고 주장한다. 칼뱅은 이러한 은유나 심상이 하나님께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악행을 지속하는 너희는 내게 견딜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22]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해 징벌을 내리실 때 신음하신다. 칼뱅은 이사야 1장 24절을 해석하면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선포하신다고 썼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들 편에 서 계실 것이라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은 그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렸다. 그러나 칼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적이 되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주석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땅히 내리셔야 할 고난을 주는 일을 매우 주저하신다는 사실이다. 칼뱅은,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선을 행하기를 가장 원하심을 강조한다. 그러나 죄악된 이스라엘로 인해 징벌이 불가피해졌음에도 하나님은 이를 집행하는 것을 매우 꺼리신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께서 징벌의 위협을 “일종의 신음과 함께” 내리셨다고 말한다.[23] 특히 칼뱅은 이 구절에서 사용된 הוי (호이)라는 감탄사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다고 결론짓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24] 요약하면, 자기 백성에게 마땅히 내려야 할 징계를 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정서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칼뱅은 해석하고 주장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 칼뱅은 예레미야 3장 4절 주석에서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초대하신다. 뿐만 아니라, 징벌의 강도를 낮추시며 그들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약속하신다. 칼뱅은 하나님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탄식하신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가능한 한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어하신다고 주장한다.[25] 여기서 칼뱅은 하나님의 이러한 감정을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실제로 슬퍼하고 탄식하신다고 단언한다.
4.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왜 칼뱅은 하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 해답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신론을 근거로, 칼뱅은 하나님에게 감정적인 고난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는 칼뱅의 예레미야 31장 20절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창자가 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칼뱅은 하나님께 실제로 창자가 없다고 단언한다.[26] 여기서 이 은유적 표현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칼뱅은 설명한다[27]. 칼뱅은 비록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고통받지는 않으시지만, 이러한 정서적 고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한다.[28] 곧 사랑하시기에 창자가 끓듯이 괴로워하신다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칼뱅은 호세아 11장 8-9절을 해석하며, 백성이 반역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감정적 고통을 겪으신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심각히 고려하셨다고 한다. 이 맥락에서 칼뱅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아버지임을 잊으실 수 없다”고 말한다.[29] 이어서 칼뱅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자녀들의 악행을 보며 큰 고통과 슬픔을 겪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자비로 용서하려는 사랑의 성향이다.[30]
이처럼 이 두 사례에서 칼뱅은 사랑과 고난이 본질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칼뱅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죄를 범할 때 고난을 겪으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이 역시도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칼뱅 신학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고난 받으신다는 사실은 그가 사랑의 아버지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칼뱅도 하나님이 자기 고난받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고난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31]
5. 칼뱅이 주장하지 않는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칼뱅은 하나님의 감정적 고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칼뱅이 하나님의 수난 가능성(divine passibility)에 대해 말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완전히 같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 칼뱅은 하나님의 감정을 유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칼뱅의 전체 신론이 유비적 사고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성경과 창조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비의 방식으로 보여주신다.[32] 칼뱅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유비적 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또 “그 모든 속성”을 간접적으로 부족하게나마 알 수 있다.[33]
이 신학 방법론은 하나님의 감정적 수난에 대한 칼뱅의 이해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된다. 칼뱅은 하나님의 감정이 인간의 감정과 동일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34] 유비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감정적 고난과 인간의 감정적 고난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하나님의 슬픔과 우리의 슬픔을 비교하며, 사랑은 슬픔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다음 지점으로 이어진다.
둘째, 칼뱅에게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신다. 시편 81편 13절을 주석하며, 칼뱅은 하나님이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non quod obnoxius sit humanis passionibus)”고 표현한다.[35] 칼뱅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하나님께 감정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감정에 지배되거나 혼란스러워지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감정에 의해 하나님은 약해지거나 좌우되지 않으신다.[36] 비슷하게,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어떤 “정서적 혼란(perturbationis affectum)”에도 휘말리지 않으신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감정은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거나 격앙되지 않는다고 말한다.[37] 이를 바탕으로 칼뱅을 해석한다면, 칼은 격정(passions)과 감정(emotions)을 나눈다고도 볼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으시지만, 격정은 없으시다. 온전히 슬퍼할 수 있으시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혼란에 빠지지 않으신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6. 결론
선교적 신학자들은 선교가 고난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 아래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론이 탄탄한 근거로 자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테일러가 가장 힘 있게 자기 주장을 펼쳐주었으나, 지면 관계상 그 깊은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 필자는 칼뱅 신학을 통해 그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했다. 어떻게 정서적으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아쉽게도 칼뱅은 이러한 고난을 선교와 연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칼뱅에 의하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다. 고난을 수반하는 이 사랑을 근거로 선교적 신학을 외치는 우리들은 고통을 가져오는 선교라는 고귀한 사명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미주
- Christopher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6), 62. ↩
- Wright, The Mission of God, 75. ↩
- Wright, The Mission of God, 78. ↩
- Wright, The Mission of God, 91. ↩
- Wright, The Mission of God, 104. ↩
- Wright, The Mission of God, 122-123. ↩
- Wright, The Mission of God, 123. ↩
- Wright, The Mission of God, 129. ↩
- Michael W. Goheen, Introducing Christian Mission Today: Scripture, History and Issue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4), 69. ↩
- Goheen, Introducing Christian Mission Today, 261. ↩
- Wright, The Mission of God, 178. ↩
- Wright, The Mission of God, 272. ↩
- Wright, The Mission of God, 231. ↩
- 스티븐 테일러, “고난의 선교적 해석,”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22), 29-30. ↩
- 테일러, “고난의 선교적 해석,” 35. ↩
-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60), 1. 13. 1. ↩
- Calvin, Institutes, 2. 14. 2. ↩
-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trans. William Pringle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10), 3:348. ↩
-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trans. John Owen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10), 5:363. ↩
- Calvin, Minor Prophets, 5:363. ↩
- Charlton T. Lewis and Charles Short, Harpers’ Latin Dictionary (New York: Harper & Brothers, 1891), 1002. ↩
- Calvin, Minor Prophets, 2:196-197; 참조. Nicholas Wolterstorff, “The Wounds of God: Calvin’s Theology of Social Injustice,” Reformed Journal 37.6 (1987): 14-22. ↩
- Calvin, Isaiah, 1:78. ↩
- Calvin, Isaiah, 1:79. ↩
-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Prophet Jeremiah and the Lamentations, trans. John Owen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10), 1:160. ↩
- Calvin, Jeremiah, 4:105. ↩
- Calvin, Jeremiah, 4:108-109. ↩
- Calvin, Jeremiah, 4:109. ↩
- Calvin, Minor Prophets, 1:402. ↩
- Calvin, Minor Prophets, 1:402; 참조. Robert D. Brewis, “So Passionate He Is Impassible: Impassibility Defined and Defended,” Churchman 131.2 (2017): 135. ↩
- Nicholas Wolterstorff, “Suffering Love,” in Inquiring about God, ed. Terence Cune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201-202; 참조. Charles Hartshorne, The Divine Relativity: A Social Concept of G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48. ↩
- Calvin, Institutes, 1. 10. 1-2. ↩
-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trans. John Owen (Bellingham: Logos Bible Software, 2010), 70-71 (Romans 1:20). 칼뱅이 유비를 이해했던 방식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andall C. Zachman, “Calvin as Analogical Theologia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1 (1998): 162-187; For rest Buckner, “Calvin’s Non-Speculative Methodology: A Corrective to Billings and Muller on Calvin’s Divine Attributes,” in Calvinus Pastor Ecclesiae: Papers of the Eleven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alvin Research, ed. Herman Selderhu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6), 233-243; Gerald Lewis Bray, The Doctrine of God (Downers Grove: IVP, 1993), 80-82; T. F. Torrance, Trinitarian Perspective Toward Doctrinal Agreement (Edinburgh: T&T Clark, 1994), 37. ↩
-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그 예시를 찾을 수 있다. Calvin, Jeremiah, 4:108-109. ↩
- Calvini Opera, 31:765. ↩
-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칼뱅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유사하시면서도 동시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음을 주장했다. 참조. P. G. W. Glare, Oxford Latin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339-1340. ↩
- Calvin, Institutes, 1. 17. 13; Glare, Oxford Latin Dictionary, 1499. 칼뱅이 하나님과 인간의 감정을 비교한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Alden C. McCray, “‘God, We Know, Is Subject to No Passions.’: The Impassibility of God in Calvin’s Commentaries as a Test-case for the Divine Attributes,” in Calvinus frater in domino: Papers of the Twelf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alvin Research, eds. Arnold Huijgen and Karin Ma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0), 295-307. ↩
괴로워하시는 하나님과 선교, 그리고 칼뱅 © 2024 by 하늘샘 is licensed under CC BY-NC 4.0


.png)